
[송현숙 '붓질의 다이어그램'. 4월16일 세월호 비극을 생각하며 그림)Brushstrokes-Diagram(Painted on the impression of the Sewol-ship tragedy on April the 16th 2014,2014,Tempera on canvas,170x240cm]
재독작가 송현속(63)의 '붓질의 다이어그램'이 가슴을 울린다.
짙은 검정 바탕의 캔버스는 보는 순간 또 먹먹해진다. 고요함과 적막함 속에 침전되며 사라지는 세월호와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무한 반복되는 붓의 움직임 속에, 깊고 검은 바다 속 울부짖는 탑승객들의 외침이 뒤엉켜 있다.
독일 함부르크 교외에서 거주하는 작가는 신문 등을 통해 세월호 사고 소식을 접하고 고통 속에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그의 회화는 깊고 깊은 우물같다. 동양과 서양의 기법이 섞인 화면은 '묘한 그리움'에 사무치게 한다.
서양 물감인 템페라와 캔버스를 사용하지만 한국의 '귀얄 붓'으로 단숨에 긋는 한 획에 담긴 고요함과 정갈함, 그리고 이를 통해 탄생하는 '이성적 제목'의 아우라가 강하다. '5획', '14획', '6획 뒤에 인물', '7획 뒤에 인물' 등 실제 그림에 사용된 붓의 획수를 딴 이름이 붙었다.
고요함 속에 서예의 필력이 보여주는 에너지가 강렬한 그의 그림에 대해 전시 서문을 쓴 미술평론가 로렌스 린더는 "그에게서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는 고도의 육체노동"이라며 "작품은 어둠으로부터 빛의 생성, 절제의 흔적, 균형의 성취, 베일의 단절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덧없음의 여운을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숨과 획이 동시에 일어나는 작가는 마치 태극권을 하듯 팔과 다리와 함께 온몸을 움직이며 작업한다고 한다.
14일 서울 학고재갤러리에서 송현숙의 개인전이 개막했다. 2008년 이후 한국에서 6년만에 열리는 전시다.
몇 번의 붓 놀림으로 이제는 기억의 한편에 사라져 버린 항아리 그림을 비롯해 횃대에 걸린 하얀 천, 장독 등의 이미지를 소재로 한 신작 16점이 걸렸다. 뼈 같은 하얀색, 불 같은 붉은색, 꽃가루 같은 노란색과 같이 제한적이지만 강렬한 색상을 사용해 빛나는 항아리의 이미지를 몇 번이고 화폭에 옮겨왔다.
아른거리는 고향 땅과 이국의 낯섦, 슬픔과 갈등, 사회성, 시대의식의 잔상이 캔버스에 담겨 있다. 전시는 12월 31일까지. 02-720-1524~6

[송현숙,8획 8brushstrokes,2014,Tempera on canvas,170x130cm]

[재독작가 송현숙]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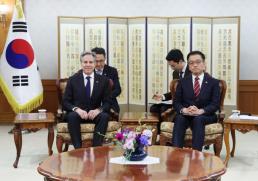


![[포토] 개막 앞둔 CES 2025](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06/20250106203539844914_388_136.jpg)
![[포토] 한자리에 모인 4대 총수 (2025 경제계 신년인사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03/20250103230547467123_388_136.jpg)
![[포토] 혼란스러운 한남동 관저 일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03/20250103091041584033_388_136.jpg)
![[포토]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 해산시키는 경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02/20250102171858772703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