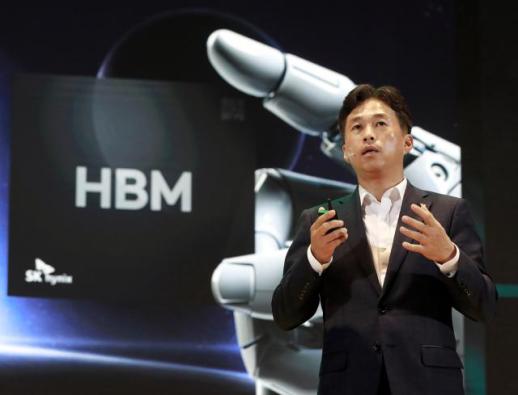워크아웃 졸업 4년차인 금호타이어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매각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금호타이어에 대한 산업은행의 경영관리 및 위기 대처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 28일 실무 회의를 열고 금호타이어의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법정관리, 제3자 매각 등 여러 대안들이 제시·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노사가 제시한 자구안은 채권단이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채무상환에 있어 한 달의 유예기간을 준 만큼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렇게 각자의 길을 가는 듯 했으나 박 회장과 산업은행의 악연은 계속됐다. 지난해 진행됐던 금호타이어 매각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실 금호타이어 매각은 채권단 내부에서부터 삐걱거렸다. 지분 비중이 큰 우리은행(14.15%)과 산업은행(13.51%)이 채권 만기 연장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여신을 돌려받길 바라는 우리은행과 매각에 초점을 맞춘 산업은행은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승기는 산업은행이 잡았다. 하지만 인수전에 참여하는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와 상표권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었다. 꽤 오래 설전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을 불허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건부 허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가 요구한 매각가격 인하도 한 차례 수용했다. 산업은행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무조건 매각부터 하겠다는 의지였다.
결과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더블스타가 또다시 매각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면서 매각이 최종 무산된 것이다. 무려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이런 가운데 산업은행은 워크아웃 시절부터 산업은행 출신 인사를 금호그룹 사옥에 두고 내부 단속을 했다는 후문이다. 기존에도 눈치가 보였지만, 박 회장과 산업은행이 한창 다툴 때는 금호 측 관계자들의 부담감이 극심해던 것으로 알려진다.
다소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대우건설과 마찬가지로 금호타이어 사외이사들 중에는 산업은행 출신(임홍용 전 KDB자산운용 사장)이 있는데, 당초 업계에서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는데 긍정적일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박 회장과 산업은행의 깊은 골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부터 최근 한국GM까지 산업은행의 경영상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며 "금호타이어도 그 중 하나로, 산업은행의 판단 착오가 반복되면서 매번 생존을 걱정하는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美 대선 D-day] 해리스 ‘통합’ vs 트럼프 ‘심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4/20241104144717945162_258_161.jpg)



![[포토] 빨갛게 물든 가을 단풍 속으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3/20241103154506896273_388_136.jpg)
![[포토] 민주당,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2/20241102145949685139_388_136.jpg)
![[포토] 국회 운영위,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 두고 갈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1/20241101105312866865_388_136.jpg)
![[포토] 경찰 배치된 임진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31/20241031102721910736_388_1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