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그러나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않고 내딛는 건설업의 새 봄맞이는 그리 가볍지 못하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SOC(사회기반시설) 투자의 축소와 공공공사의 수익성도 개선될 조짐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런 현상은 건설업의 위상과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를 평가 절하하는 것이어서 염려된다. 건설업이나 SOC 투자를 두고 정부와 업계, 국민들 간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관행도 개선될 조짐이 없다. 공공공사 저가발주는 국민이 낸 세금을 아껴 쓴다는 명분이지만 내막은 다르다.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장들이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건설업체의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공공사의 기획초기 예정가격 대비 산업계의 실제 수주금액은 50~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확정된 '2019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내년도 SOC 예산안은 올해(19조원) 대비 최소 10% 넘게 줄어든 17조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SOC 예산 감축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2019~2021년 연평균 SOC 예산은 16조6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방향전환은 정부의 인식 변화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판단한다. 과잉투자를 우려하는 시각이다.
실상은 다르다. 한국의 인구당 도로연장은 2.11(㎞/1000명)인데 반해 미국 21.09, 프랑스 16.38, 스페인 14.48, 일본 9.56, 독일 7.82 등이다. 우리가 주요국 대비 무척이나 낮은 수준이다. 국토면적과 인구를 모두 고려한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OECD 34개국 중 29위다.
선진국들의 경우 우리보다 월등히 앞선 인프라 환경속에서 투자규모를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확대하는 분위기다. 몇몇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1인당 교통인프라 투자액을 비교해보면 일본은 한국의 2.2배, 캐나다가 2.6배, 오스트레일리아는 5.7배에 달한다.
정부의 바뀌는 건설산업 관련 정책 방향과는 달리 국민들이 건설산업에 거는 기대는 여전하다. 내수에 의존해 살아가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건설산업을 쳐다본다. 건설이 잘돼야 내수가 살고 서민들의 삶이 나아진다는 공식은 지난 수십년간 한국경제에서 변함이 없는 것이다.
정부의 SOC 투자 축소계획은 지금이라도 재고돼야 할 정책이다. 건설업이 마주하는 환경 가운데 SOC 투자정책이나 공공공사 저가발주 문제만 손질해도 국민들 삶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한국 경제와 사회에 가장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청년실업을 다소나마 줄이는 현실적 대안을 건설산업 활성화에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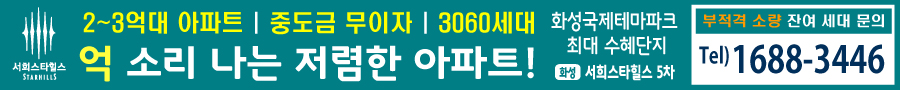








![[포토] 얼음 둥둥 떠다니는 한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5/20250205220625406252_388_136.jpg)
![[슬라이드 포토] 최강 한파속 열린 서울패션위크 2025, 추위 잊은 패션 멋쟁이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5/20250205145057996581_388_136.jpg)
![[포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참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4/20250204145801361328_388_136.jpg)
![[포토] 카카오, 국내 최초로 오픈AI와 손 잡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4/20250204141747196830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