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쏟아지며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주요 IT(정보기술) 기업들도 잇따라 관련 서비스를 내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국내 AI 기술력이 미국과 일본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중국 등에는 바짝 추격당하는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방위적인 투자에도 기술격차 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지난해 124억 달러(약 13조8000억원)에서 2021년 522억 달러(약 58조원)로 불과 3년 만에 4배 넘게 커질 전망이다. 한국의 AI 산업 규모도 2016년 5조4000억원에서 2020년 11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19.7%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시장 규모 확대에 발맞춰 재계 1위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한국 AI 총괄 연구개발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들어서만 캐나다, 러시아 등 세계 주요 국가 5곳에 글로벌 거점을 세우고 AI 기술 확보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한국·미국·영국·캐나다·모스크바 등 해외 글로벌 AI 연구 거점에 2020년까지 1000명의 인재를 확보한다는 전략도 내놨다. 스타트업, 벤처 등 외부와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삼성전자 산하 혁신조직 '삼성 넥스트'가 AI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한 전용 펀드 '넥스트 Q 펀드(NEXT Q Fund)'를 조성하기도 했다.
LG전자도 이달 초 캐나다에 '토론토 AI 연구소'를 열었다. 이는 LG전자가 해외에 처음 설립한 AI 전담 연구소로 다음 달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6월 중국 AI 분야 스타트업인 '딥글린트'와 기술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AI 영상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서 2015년엔 중국 최대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바이두'와 자율주행 플랫폼 연구 프로젝트인 '아폴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다.
네이버도 AI 인재 확보를 바탕으로 기술력 확보에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컴퓨터 비전·딥러닝 콘퍼런스 'CVPR2018'에 참석해 전세계 AI 전문가를 대상으로 모집 활동을 벌였다. 지난 4월에는 홍콩과학기술대에 30~40명 규모로 '네이버·홍콩과기대 AI 연구소'를 세우며 아시아 지역 AI 인재 영입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네이버랩스유럽 인수로 유럽 지역 AI 인재 80여명을 확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이 같은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AI 기술력 수준은 주요 선진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AI 기술 수준이 100이라면 한국은 78.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유럽 88.1, 일본 88.0. 중국 81.9 등에도 뒤지는 수치다.
특히 국내 AI는 단순 상품이나 특정 서비스에만 한정돼 기초연구, 응용·개발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구의 척도로 볼 수 있는 논문의 수도 크게 뒤처진다.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발표한 AI 논문은 중국이 13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1만건), 일본(4만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만9000건으로 11위에 그쳤다.
◆ 전면적인 산업확충·정부 지원 필수
업계에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고 AI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산업기반 확충과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일례로 중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AI 육성에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13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에 AI를 처음으로 핵심 지원 사업에 포함시켰고, 지난해 ‘차세대 AI 발전 규획’을 발표, 2030년까지 AI 핵심산업 규모를 1조 위안(약 172조원), 연관산업은 10조 위안 규모로 키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8일 20조4000억원에 이르는 2019년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R&D 예산의 증가폭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기초·원천기술 R&D에 1조7000억원, 3대 전략투자 사업(데이터·AI·수소경제)과 8대 선도분야 사업 R&D에 1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둘을 합친 규모는 3조1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교수는 "AI와 미래 자동차 등의 분야는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기술 개발이 기반돼야 하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AI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규제가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과하다"며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 등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장 규모 확대에 발맞춰 재계 1위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한국 AI 총괄 연구개발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들어서만 캐나다, 러시아 등 세계 주요 국가 5곳에 글로벌 거점을 세우고 AI 기술 확보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한국·미국·영국·캐나다·모스크바 등 해외 글로벌 AI 연구 거점에 2020년까지 1000명의 인재를 확보한다는 전략도 내놨다. 스타트업, 벤처 등 외부와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삼성전자 산하 혁신조직 '삼성 넥스트'가 AI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한 전용 펀드 '넥스트 Q 펀드(NEXT Q Fund)'를 조성하기도 했다.
LG전자도 이달 초 캐나다에 '토론토 AI 연구소'를 열었다. 이는 LG전자가 해외에 처음 설립한 AI 전담 연구소로 다음 달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네이버도 AI 인재 확보를 바탕으로 기술력 확보에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컴퓨터 비전·딥러닝 콘퍼런스 'CVPR2018'에 참석해 전세계 AI 전문가를 대상으로 모집 활동을 벌였다. 지난 4월에는 홍콩과학기술대에 30~40명 규모로 '네이버·홍콩과기대 AI 연구소'를 세우며 아시아 지역 AI 인재 영입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네이버랩스유럽 인수로 유럽 지역 AI 인재 80여명을 확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이 같은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AI 기술력 수준은 주요 선진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AI 기술 수준이 100이라면 한국은 78.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유럽 88.1, 일본 88.0. 중국 81.9 등에도 뒤지는 수치다.
특히 국내 AI는 단순 상품이나 특정 서비스에만 한정돼 기초연구, 응용·개발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구의 척도로 볼 수 있는 논문의 수도 크게 뒤처진다.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발표한 AI 논문은 중국이 13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1만건), 일본(4만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만9000건으로 11위에 그쳤다.
◆ 전면적인 산업확충·정부 지원 필수
업계에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고 AI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산업기반 확충과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일례로 중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AI 육성에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13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에 AI를 처음으로 핵심 지원 사업에 포함시켰고, 지난해 ‘차세대 AI 발전 규획’을 발표, 2030년까지 AI 핵심산업 규모를 1조 위안(약 172조원), 연관산업은 10조 위안 규모로 키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8일 20조4000억원에 이르는 2019년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R&D 예산의 증가폭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기초·원천기술 R&D에 1조7000억원, 3대 전략투자 사업(데이터·AI·수소경제)과 8대 선도분야 사업 R&D에 1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둘을 합친 규모는 3조1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교수는 "AI와 미래 자동차 등의 분야는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기술 개발이 기반돼야 하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AI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규제가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과하다"며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 등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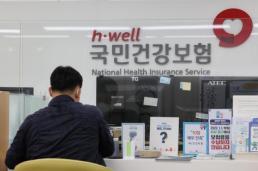

![[포토] 배우 김새론 발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9/20250219121051906909_388_136.jpg)
![[포토]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KF-21 첫 시험비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9/20250219151445357011_388_136.jpg)
![[포토]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9/20250219120708811941_388_136.jpg)
![[포토] 윤석열 대통령, 헌재 출석 않고 구치소 복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8/20250218143715320315_388_136.jpg)




![[속보] 한덕수 비상계엄 모두 걱정·만류…찬성 없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0/20250220162225643964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