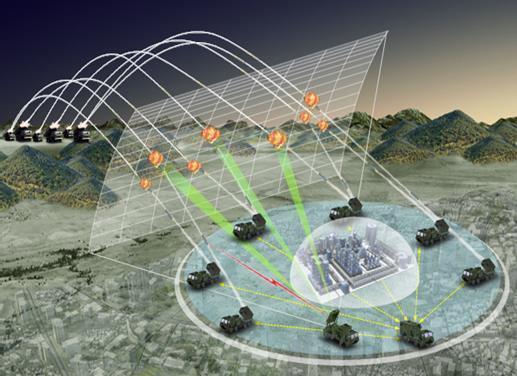송광사 벚꽃길. 찻길에 늘어선 벚나무가 마음을 사로잡는다. [사진=기수정 기자]
바람에 실려 온 벚꽃잎이 비가 되어 흩날리는 완주. 발길 닿는 곳마다 펼쳐진 벚꽃 융단을 마주하고 있자니, 문득 몇 해 전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희성(변요한 분)이 읊조리던 말귀가 떠올랐다.
술 한잔 하고 거리로 나선 유진(이병헌 분)과 구동매(유연석), 그리고 희성의 머리 위로 하얀 벚꽃잎이 흩날리자, 희성은 시를 읊듯 말했다. "일본인과 미국인 사이에서 난 날마다 죽소. 오늘 나의 사인(死因)은 화사(花死)요."
따스한 햇살, 살랑이는 바람에 나부끼는 벚꽃잎이 온몸을 감싸니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솟구쳐 올랐다. 코로나19 여파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던 우울함과 안녕을 고했다. 사인(死因)은 역시 '화사(花死)'.


송광사 종루. 뒤편 종남산과 앞쪽 붉은 목련이 종각의 자태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사진=기수정 기자]
흩날리는 벚꽃잎, 수선화·목련에 마음 뺏겼네
송광사로 향하는 길목, 무려 1.6㎞에 달하는 길 양쪽을 벚나무가 장식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여파에 심신이 지쳐서였을까. 매년 피는 벚꽃인데, 매년 봄이면 만나는 벚꽃인데, 햇살과 바람을 머금은 채 흔들리는 벚나무 행렬은 왠지 유난히 고결했고, 눈부시게 빛났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퍼질 이 거리······." 이맘때, 이 경관을 보면 저절로 떠오르는 노래 '벚꽃엔딩'의 후렴구를 흥얼거렸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시 내려 이 행복한 기운을 만끽하고 다시 차에 몸을 실은 우리는 꽃비를 온몸으로 맞는 상상을 하며 천천히 달렸다.
드디어 송광사 입구에 다다랐다. "이런 평지에 자리한 사찰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송광사를 찾기 참 수월하다"는 일행. 나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또 다른 일행은 기다렸다는 듯 얘기했다. "조계사와 봉은사도 평지에 있지 아마? 그것도 도심 한가운데에."
늘 지나다니던(심지어 매일 점심때면 조계사를 가로질러 식당으로 향한다) 그 사찰들은 생각지도 못한 채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으니, 생각해 보면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지 않은가.
각설하고, 송광사를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다. 고즈넉한 사찰에는 봄의 정취가 가득했다. 벚꽃 외에도 수선화부터 복사꽃, 금낭화까지 시선을 사로잡는 봄꽃이 사찰의 풍광에 정점을 찍어주었다.
종남산 아래 위치한 사찰 '송광사'는 신라 도의선사가 세웠다고 전해진다. 당시 백련사였던 이 사찰은 일주문이 3㎞나 떨어져 있었다. 규모가 얼마나 큰지 대략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사찰은 임진왜란 중 전소됐다가 1622년(광해군 14)부터 재건하기 시작했고, 14년 만인 1636년(인조 14)에 완공됐다. 이때부터 이 절은 '백련사'가 아닌 '송광사'로 불린다.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 일자(一字)로 배치된 자연스러운 모습은 우리나라 전통 정원의 분위기를 풍긴다. 경내에는 대웅전(보물 1243)과 종루(보물 1244), 소조삼불좌상·복장유물(보물 1274), 소조사천왕상(보물 1255) 등 다수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 또한 높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옥성당인 되재성당. [사진=기수정 기자]
박해 피해 숨어든 곳에서 믿음의 꽃 움텄다··· 우리나라 최초 한옥성당 되재성당
송광사에서 얼마나 머물렀을까. 일행은 "완주에 오면 꼭 가보고 싶었다"며 손을 잡아끌었다. 대체 어디를 가려는 걸까. 영문도 모른 채 그의 손에 이끌려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다.
30~40분을 달리니 작은 한옥이 눈에 들어왔다. 그가 와 보고 싶다던 목적지, '되재성당'이었다. 이 자그마한 체구의 한옥이 성당이라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벚꽃잎이 가득 매달린 벚나무 한 그루는 팔작지붕을 얹은 5칸짜리 한옥 성당과 나무 종탑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주고 있었다.
이곳 되재성당이 건립된 지는 올해로 126년이 됐다. 한국 천주교회 중 서울 약현성당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이 성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옥성당이다. 6·25전쟁 때 건물이 완전히 소실됐다가 2008년 복원됐다.
'되재(升峙)'라는 명칭은 화산면 승치리에 위치한 고개를 말한다. 되재성당이 지어지게 된 배경에는 '병인박해'가 있다. 신도들은 이를 피해 험준한 되재를 넘었고, 골짜기에 신앙의 터를 잡고 성당을 지었으며, 그렇게 믿음의 꽃을 피웠다.
되재성당은 특이하게도 툇마루마다 출입구가 설치돼 있었다. 좌측은 남자 출입문, 우측은 여자 출입문이다. 성당 내부로 들어가면 신자석 가운데를 칸막이로 갈라 놓은 것도 남녀를 구분하기 위함이었다. 어린이와 중년, 노인의 문도 설치해 놓았다. '남녀상열지사'와 '장유유서'의 흔적이다.
실타래처럼 뒤엉키며 풀리지 않았던 머릿속 생각들은 신기하게도 '송광사'와 '되재성당'에서 머무는 동안 스르르 풀려나갔고, 지난 1년 짓눌렀던 우울의 무게가 눈 녹듯 녹아내렸다. 머릿속은 맑아졌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기독교인인 내가 교회가 아닌 사찰과 성당 안에서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이 퍽 생경하면서도 뭉클했다. 나름대로 '종교 대통합'을 한 것인가, 엉뚱한 생각에 헛웃음이 나왔다.
벚꽃을 오롯이 눈과 마음에 담았고, 구이저수지와 경천호수, 편백숲, 경천애인농어촌학교에 이르기까지 완주의 속살을 들여다봤다. 짧은 여정이어서 더욱 귀했다.
짧은 여행을 마친 후 돌아온 서울, 주말 내내 내린 빗줄기와 함께 분홍빛 꽃잎은 후두둑 떨어져내렸고, 꽃망울이 움텄던 자리엔 초록빛 잎들이 빼곡히 들어앉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또다시 거세져 착잡함을 감출 길 없지만, 사진 속에 그리고 가슴 한편에 남아 영롱히 빛나는 그날의 낭만과 행복을 떠올리며 힘듦을 이겨내리라.






짧은 여행을 마친 후 돌아온 서울, 주말 내내 내린 빗줄기와 함께 분홍빛 꽃잎은 후두둑 떨어져내렸고, 꽃망울이 움텄던 자리엔 초록빛 잎들이 빼곡히 들어앉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또다시 거세져 착잡함을 감출 길 없지만, 사진 속에 그리고 가슴 한편에 남아 영롱히 빛나는 그날의 낭만과 행복을 떠올리며 힘듦을 이겨내리라.

송광사 전경. 뒤에 병풍처럼 서 있는 산은 '종남산'이다. [사진=기수정 기자]

완주 상관 공기마을 편백숲. 곧게 뻗은 편백이 눈길을 끈다. [사진=기수정 기자]

송광사 초입에서 만난 복사꽃[사진=기수정 기자]

송광사 앞에 피어난 수선화[사진=기수정 기자]

경천애인 농어촌인성학교 앞에도 '벚꽃' 천지다. [사진=기수정 기자]

경천애인 농어촌인성학교에서 운영 중인 '깡통기차' 탑승체험. 신나게 달리며 마을 곳곳을 둘러볼 수 있다. [사진=기수정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 이재명 대표 만난 6대 은행장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0/20250120195852217370_388_136.jpg)
![[포토] 출입통제 강화된 서부지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0/20250120122826643442_388_136.jpg)
![[포토] 영화 미키17 기자간담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0/20250120122907187615_388_136.jpg)
![[포토] 습격당해 외벽 파손된 서부지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19/20250119095353763205_388_1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