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화재로 불타 버린 숭례문에 대해 문화재청은 “2006년 작성해놓은 ‘숭례문 정밀실측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원형 그대로 복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숭례문에 쓰인 모든 목부재와 기와, 돌의 크기를 mm단위로 쟀을 정도로 정밀하게 기록돼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계획과 달리 숭례문의 완전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숭례문의 기둥과 보로 쓰인 나무의 나이테를 조사한 결과 위층 대들보 위 기둥에 얹혀 있는 마룻보와 고주(高柱, 높은 기둥)는 조선 태조 숭례문 창건 당시의 목재였다. 화재로 불타 버린 숭례문 기둥에 쓰인 소나무는 과연 최고 목질의 나무였을까.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는 느티나무가 소나무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으며 궁궐이나 중요한 목조건물을 지을 때 많이 쓰였다. 내구성도 느티나무가 더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조선시대에는 소나무가 널리 쓰였다. 고려 말기 몽골의 침입이나 무신정변 같은 사회 혼란을 겪으면서 축대벽을 쌓거나 건물을 짓느라 숲 속의 느티나무를 마구 벤 탓이다.
곧고 크게 자라는 나무로 전나무도 있다. 하지만, 금강소나무는 나무 바깥쪽의 변재보다 안쪽의 심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미생물이나 흰개미의 공격에 더 강하다. 심재가 2차 대사산물이나 송진 같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왕실에서 금강소나무를 궁궐 목재로 고집한 것도 이런 이유다.
그런데 현재 지름 1m가 넘는 금강소나무가 국내에 별로 없으며, 있어도 개인 소유로 정부가 활용하기 쉽지 않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선 궁궐의 보수나 복원을 위해 별도의 숲을 관리하고 있다. 가령 일본에서 3대 아름다운 숲으로 꼽히는 기소지방의 편백나무림은 일본 왕가의 조상신을 모시는 이세신궁(伊勢神宮)의 보수에 필요한 목재를 공급하고자 마련된 곳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산림청이나 문화재청이 앞장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글 : 서금영 과학칼럼니스트)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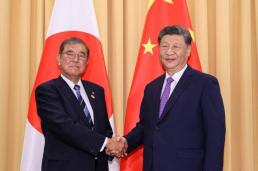
![[날씨] 아침 기온 0도 안팎 뚝…일교차 15도 내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3/20241123161702152439_258_161.jpg)
![[슬라이드 포토] 성수동이 들썩 오데마 피게 포토콜 참석한 스타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2/20241122205657914816_388_136.jpg)
![[포토] 제8회 서민금융포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1/20241121114536531007_388_136.jpg)
![[포토] 기조연설 하는 페이커 이상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0/20241120115246771576_388_136.jpg)
![[포토] 발왕산은 벌써 겨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205226273772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