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휴대전화 선진국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2위와 3위에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국의 고사양 제품은 높은 기술력과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한국 휴대폰 유저들은 아직 국내에서 출시조차 되지 않은 애플의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국산 제품을 폄훼하기 일쑤다.
애플은 아이폰의 3.0 버전을 6월 8일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 모델은 전작들과 달리 한국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유저들의 기대감 역시 매우 높아지고 있다.
아이폰에 대한 이들의 찬사를 들어보면 아이폰은 기존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폰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기에 가깝다. 그러나 그 하드웨어 사양을 찬찬히 뜯어보면 아이폰은 국내 저가 휴대폰 사양에 불과하다.
지난해 출시됐던 아이폰 3G 모델은 배터리 교환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메모리 카드 슬롯이 없어 메모리 용량 확장이 불가능하다. 해외에서는 아이폰의 수신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휴대폰으로서 기본 기능인 통화 기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국내에서는 보편화된 DMB 가능도 아이폰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카메라 해상도 역시 200만화소에 불과하다.
AS 역시 맹점이다. 국내 아이팟 유저들 가운데 애플 AS센터에 간 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불평은 수리비용이 제품 비용보다 비싸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AS 서비스에 익숙한 국내 유저로서는 아이팟의 AS정책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
아이폰의 대항마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옴니아’에 비해 어느 하나 나은 것이 없다.
모든 부분에서 국내 제품보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이 국내 휴대폰 유저들 사이에서 ‘꿈의 스마트폰’으로 인식되는 것은 단 하나, 소프트웨어의 강점 때문이다.
아이폰은 다운로드 10억 건을 기록한 ‘앱스토어’를 갖고 있다. 앱스토어에서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자유롭게 매매된다.
PC의 대표주자 격인 IBM보다 소프트웨어 전문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더욱 높게 평가받는 것처럼 아이폰은 하드웨어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오히려 호평을 받고 있다.
애플에 비해 늦었지만 국내 업체들도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마련, 소비자들이 즐겨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공급에 나서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아이폰을 구매한 사람은 2000만명에 불과하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앱스토어의 규모를 국내 기업들이 추월하는 것은 수치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올해 1분기에만 각각 4600만대, 2260만대의 휴대폰을 판매했다.
강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유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유통될 수 있는 장만 마련한다면 전세계에서 불었던 ‘아이폰 열풍’의 다음 차례는 국내 기업의 몫이 될 것이다.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단독] 레거시 줄이고 첨단 메모리 집중… 삼성, 반도체 반등 시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1/20241121140830654754_258_161.jpg)

![[포토] 제8회 서민금융포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1/20241121114536531007_388_136.jpg)
![[포토] 기조연설 하는 페이커 이상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0/20241120115246771576_388_136.jpg)
![[포토] 발왕산은 벌써 겨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205226273772_388_136.jpg)
![[슬라이드 포토] 제44회 황금촬영상 시상식 참석한 스타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8/20241118194949259743_388_13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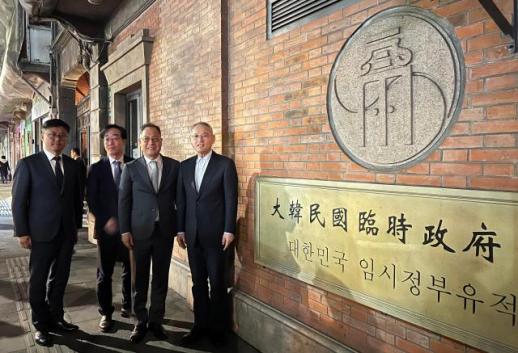




![[속보] 수능 이미 치렀는데 의협 비대위 2025년 의대 모집 중지 촉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2/20241122110800296788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