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주요 대기업 CEO들이 각자의 목표와 포부를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처럼 “올해 전 세계에서 540만대를 판매해 글로벌 선두업체로 도약 하겠다”며 올해 목표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이도 있고,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과 같이 “필요하다면 한 해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겠다”는 말로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의지를 스스로 다짐하는 CEO도 있다.
또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현대건설이야 말로 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현대건설 M&A에 대한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새해가 되면 쏟아지는 수많은 신년사 속에서 기자가 유독 보고싶은 것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신년사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전 회장은 세 치 혀로 경영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내뱉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꼭 필요한 때, 반드시 필요한 얘기를 한다.
1993년의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발언이나 2000년의 ‘10년 후에 뭘 먹고 살까’, 2007년의 ‘샌드위치’론이 좋은 예다.
1993년 이 회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임원 회의를 열고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며 제창한 신경영은 그 때까지 일본 전자업계를 따라만 하던 삼성전자를 글로벌 시장의 강자로 부각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또 외환위기 직후 “10년 후에 뭘 먹고 살것인지 고민”이라며 그가 던진 화두는 그동안 선진국의 산업 트렌드를 쫓기에 급급했던 한국의 기업들에게 최초로 미래 투자, 신성장동력이라는 개념을 심어주었다.
또 삼성 비자금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가 제기한 ‘샌드위치론’은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게 해줌으로써 우리 기업인들과 국민을 각성시키는 여할을 했다.
이처럼 이 전 회장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화두를 던지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20년간 삼성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재계 총수들의 신년사를 보며 2년여 동안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이 전 회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던 차에 마침 이 회장이 신년 벽두에 라스베이가스의 가전 전시회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가 기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꼼꼼히 읽어봤다. 하지만 실망스러웠다.
이 전 회장의 말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경쟁력으로 높은 실적을 올린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한 자부심이 배어 있었지만 딱 거기 까지 였다.
기자가 이 전 회장에게 기대한 미래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과 날카로운 화두는 없었다. 그저 ‘까딱하면 삼성도 구멍가게로 전락한다’ 거나 ‘사회 각 분야가 정신차려야 한다’는 막연한 경계의 말만 있었을 뿐이다.
아마도 이 전 회장은 비자금 사건 재판과 사면복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과 숙제 때문에 삼성과 한국 기업의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사색의 시간을 가지 못한 듯하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의 본령은 누가 뭐래도 경영이다. 그가 비록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처럼 현장에서 임직원을 이끄는 스타일의 경영인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그는 촌철같은 한 마디로 삼성의 임직원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기업인 모두에게 큰 울림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전 회장에게 기대하는 것도 바로 그 같은 모습이다.
이 전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논란을 훌훌 털어 버리고 삼성과 한국 기업이 나아갈 길에 대해 깊은 고민이 담긴 ‘한 마디’를 던질 날을 기다린다.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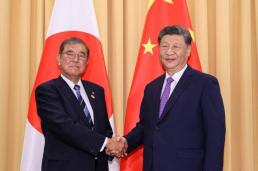
![[날씨] 아침 기온 0도 안팎 뚝…일교차 15도 내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3/20241123161702152439_258_161.jpg)
![[슬라이드 포토] 성수동이 들썩 오데마 피게 포토콜 참석한 스타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2/20241122205657914816_388_136.jpg)
![[포토] 제8회 서민금융포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1/20241121114536531007_388_136.jpg)
![[포토] 기조연설 하는 페이커 이상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0/20241120115246771576_388_136.jpg)
![[포토] 발왕산은 벌써 겨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205226273772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