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도입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그러나 이 제도 정책 효과에는 의문이 가득하다.
제도 첫 무대로 관심을 끌고 있는 부산대병원이 입찰 무질서로 물의를 빚고 있고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부산대병원 입찰에서는 서울대병원과 보훈병원으로 대표됐던 저가 덤핑 낙찰이 재현됐고 심지어 제약사들의 공급거부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병원측은 원내코드가 없으면 원외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도매업체들은 병원측 장단에 맞춰 출혈 경쟁을 서슴지 않고 있다. 도매업체들이 약 10% 내외에 불과한 원내시장보다 90%대의 원외처방 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험가 1000원짜리 약이 10원으로 둔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모 도매업체는 제약사와 사전 협의 없이 투찰을 감행해 사상 초유의 공급거부 사태 및 손해배상 소송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가 약가인하를 통한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의약품 입찰 시장을 무질서 상태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통해 환자들에게 제공됐던 실질적 혜택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입원환자나 정신과환자, 1종 급여 환자와 같이 병원에서 약을 타는 경우에만 눈에 보이는 혜택을 받게 된다. 다시말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래환자들은 당장 혜택이 없다는 말이다.
또 서울아산과 삼성서울병원 등 사립병원들이 부산대병원 등 국공립병원들 처럼 저가에 의약품을 구매해야한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경희의료원을 제외하면 대다수 사립병원들은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다. 약가인하를 통해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도 일부 병원 입원환자 등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때문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고 현실적인 대안임에도 여전히 정책 효과에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입찰 무질서와 같은 부작용이 아닌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당국의 발 빠른 대응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cys467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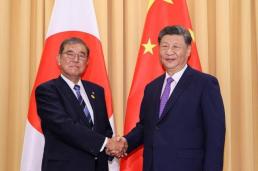
![[포토] 제8회 서민금융포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1/20241121114536531007_388_136.jpg)
![[포토] 기조연설 하는 페이커 이상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0/20241120115246771576_388_136.jpg)
![[포토] 발왕산은 벌써 겨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205226273772_388_136.jpg)
![[슬라이드 포토] 제44회 황금촬영상 시상식 참석한 스타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8/20241118194949259743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