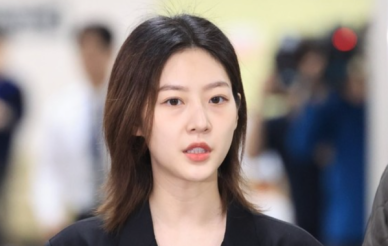|
| 윤용환(문화레저부장) |
한국을 찾는 가장 큰 손님인 일본 관광객 수는 연간 300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서서히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만 둘러봐도 잘 알 수 있다. 광복동과 중앙동을 점령했던 일본 관광객 대신 지금은 중국인으로 바뀌고 있다. 올 9월까지 한국을 찾은 중국관광객은 144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43.9% 증가했다. 이런 증가세라면 수년 내 일본 관광객을 추월해 최대의 고객이 될 것이 분명하다. 양적 증가와 더불어 중국인 방한객 유형도 바뀌고 있다.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중국 여성 관광객이다.
중국관광 개방 이후 최초로 올해 여성관광객이 남성을 추월했다. 한류 열풍과 쇼핑의 주 대상 계층인 20~30대 여성 관광객이 시장 주도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성과를 내기까지 관광공사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의 노력이 큰 힘이 됐다.
20~30대 여성층을 타깃으로 한 상품개발과 홍보, 중국 최대 은련카드와 공동으로 매년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 전용비행기 ‘제주쾌선(濟州快線), 해랑열차 크루즈, 의료관광상품, 백화점 쇼핑 등 고급 상품 홍보와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관광객의 상승세 이면에는 저가 상품의 폐해도 여전하다.
열악한 숙박시설과 질 낮은 음식, 그리고 과다한 쇼핑 강요 등이 한국관광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다. 저가 덤핑상품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랜드피(현지 여행사에 지불하는 경비. 숙식비, 교통비, 가이드비, 관광지 입장료 등 포함)다. 수익을 남기기위해서는 서비스의 저하 쇼핑 강요는 당연한 일이다. 국내 여행사의 과도한 가격경쟁도 너무 지나치다. 앞으로는 반성과 자정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여전히 가격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G2'의 자리에 올랐지만, 2009년 중국의 1인당 GDP는 3680달러로 여전히 저가 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여행사의 행태는 ‘누워서 침 뱉기’다.
특히 중국관광객 가이드 자질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관광가이드는 한국을 알리는 민간외교의 최전선에 서 있다. 그런데 함량미달의 가이드들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 너무 모른다. 심지어 ‘경주가 어느 나라의 수도였는지도 모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가이드의 처우개선문제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관광객 가이드에게는 일일 가이드비가 12~15만원씩 지급된다. 그러나 중국 관광객 가이드에게는 한 푼도 없다. 오로지 팁과 쇼핑, 식당 수수료 등으로 수입을 채워야 한다. 이런 현실이니 한국 출신 가이드는 극소수다.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가이드는 더 적다.
이러한 사태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내놓은 정부 책임이 크다.
관광공사의 전문 교육기관인 관광교육원 폐지해 한국인 가이드 육성이 중단됐다. 가이드 재교육도 뒷전이다. 겨우 1주일 교육으로 임시 자격증을 남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9월부터 가이드 자격조건과 무자격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중국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이드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궁금하다. 또 이대로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숙박시설 부족도 심각하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의 50% 이상이 서울에서 숙박을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 1만2000여실의 호텔 객실이 부족하다. 최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일 2012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3만 객실의 관광호텔을 늘리고 올해안에 겠다고 밝혔다.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도 공공기관 주도로 호텔 건설과 민간운영의 공공개발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제는 말로만 끝나지 않는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다. 그린산업이다. 미래의 블루칩이다. 이제라도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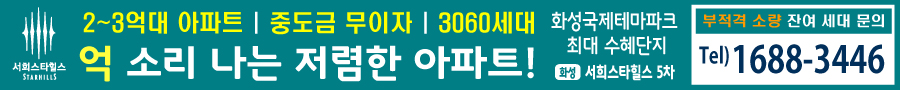







![[날씨] 포근한 주말…낮 최고기온 6∼14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5/20250215150405416291_258_161.jpg)
![[포토] 은으로 번진 골드바 품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6/20250216210750953390_388_136.jpg)
![[포토]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45226377542_388_136.jpg)
![[포토] 부산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장 화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25125795304_388_136.jpg)
![[포토] 하늘로 떠나는 하늘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25405185540_388_136.jpg)


![[ハルビンAG] 韓国フィギュア…キム・チェヨンに続きチャ・ジュンファン「シングル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3/20250213213430670456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