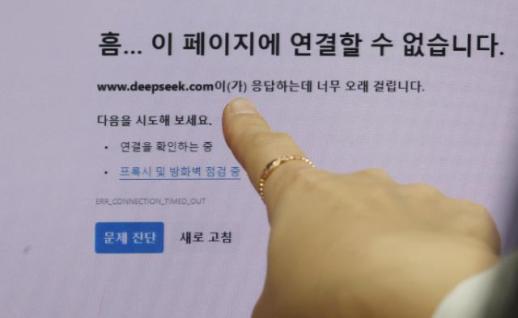|
| 권영은 기자. |
특히 올해에는 국제유가의 고가행진이 지속돼 산유국의 플랜트 발주와 중남미·아시아권의 경기회복 본격화 등으로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수주는 800억불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어 건설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해외로 몰려가고 있다.
지난해 국내 대형건설사인 A사가 올린 해외 수주고는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업계가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중동지역에서의 초대형 플랜트·토목 공사를 저가로 싹쓸이 한 덕분에 이 같은 수주고를 올렸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에 따른 부작용이다. 저가투찰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 유동성 악화 등의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싱가포르에선 국내 대형 건설사인 B사가 멀쩡하게(?) 건축공사를 마쳐 놓고도, 이 건물을 발주처로부터 역으로 사들여 임대사업에 진출한 사례도 있다. 이유는 간단했다. 내놓을 만한 실적이 없었던 이 회사가 공사를 수주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저가투찰'이었고, 이로 인해 완성도가 떨어지는 건물에 대한 발주처의 민원이 잇따르자, B사는 결국 이 건물을 사들인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해외시장에 새로이 진출한 업체들은 물론이고, 대형사들까지 저가 투찰에 뛰어들면서 업계에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과거 건설업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경제력을 갖추기 어려웠던, 중동붐이 일었던 때와는 상황이 다른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올린 건설 역사의 획을 이런 식으로 무너뜨릴 지, 아니면 국격과 실력에 맞는 대우를 받을 것인지는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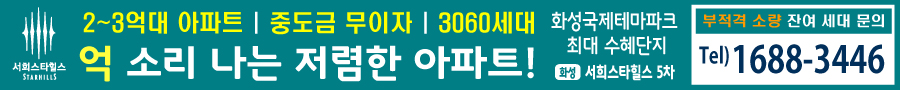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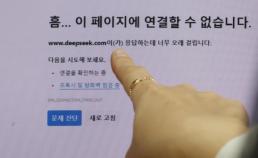





![[포토] 故 하늘 양을 추모하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54605634152_388_136.jpg)
![[포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별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04313685834_388_136.jpg)
![[포토] 은으로 번진 골드바 품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6/20250216210750953390_388_136.jpg)
![[포토]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45226377542_388_1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