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을 비롯해 인도와 브라질 등 신흥국들이 부상하면서 국가별 및 지역별로 이른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 하면서, 그 틈바구니에서 동아시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초석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통합에 둔감했던 동아시아에서도 중국과 일본이 역내 통합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3국이 금융위기 해결 뿐만 아니라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기능까지 갖춘 보다 '전사적인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CMIM는 아세안(ASEAN)+3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달러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1200억달러 규모의 다자간 통화스왑 체제다. 지난해 3월 24일부터 발효됐다.
동아시아가 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낀 때는 1997~1998년 외환위기 당시. 1997년 7월 초 헤지펀드가 태국 바트화를 공격하면서 이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주변 국가에서 단기 자금 이탈 현상이 일어났다. 그 해 말에는 결국 우리나라까지 확산됐다.
이처럼 헤지펀드의 투기와 단기 외화자금 대규모 인출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대외신인도 추락, 대기업 도산, 주가하락과 환율 상승, 한국은행 외환보유고 고갈 등 일대 혼란을 맞게 됐다.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구제를 받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경험으로 동아시아는 2008년말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파이낸셜타임즈(FT)는 CMIM 덕분에 아시아가 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사실상 첫 역내 금융 공조 시스템인 CMIM를 통해 1200억달러 규모의 안정 자금을 구축하면서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는 것.
이번에 최종 합의한 역내경제감시기구(AMRO) 역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아세안과 3국의 거시경제 동향을 상시 감시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 합의로 윤증현 장관이 임기 내내 주창했던 '아시아 경제통합'은 진일보하게 됐다. 윤 장관은 지난 3월 17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아시아 국가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이 역내 통합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대외협력을 통해 경제 외연을 확대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아시아 경제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이미 확실한 주도권을 갖고 있는 분야는 '아시아자본시장발전방안(ACMI)'과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ABMI)'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ABMI를 가장 먼저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또 채권시장 외에 주식ㆍ펀드ㆍ파생상품시장을 포괄해 자본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ACMI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윤 장관은 "위기극복 이후 역내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조달과 적절한 위험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역내 자본시장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로 3국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주권 양보 및 타협이 각국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결실 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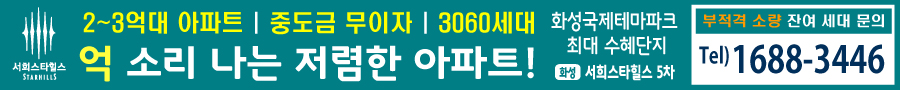







![[날씨] 포근한 주말…낮 최고기온 6∼14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5/20250215150405416291_258_161.jpg)
![[포토] 은으로 번진 골드바 품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6/20250216210750953390_388_136.jpg)
![[포토]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45226377542_388_136.jpg)
![[포토] 부산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장 화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25125795304_388_136.jpg)
![[포토] 하늘로 떠나는 하늘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25405185540_388_136.jpg)


![[ハルビンAG] 韓国フィギュア…キム・チェヨンに続きチャ・ジュンファン「シングル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3/20250213213430670456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