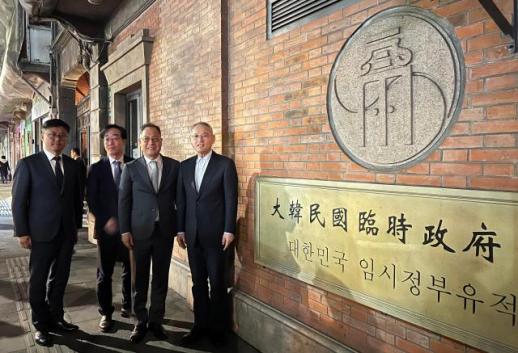(아주경제 조영빈 기자) 6개월을 끌어온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이 또다시 결렬되며 향후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주경제 조영빈 기자) 6개월을 끌어온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이 또다시 결렬되며 향후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우일렉 채권단은 지난 30일 "엔텍합이 요구한 600억원 가량의 매매대금 할인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엔텍합과의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엔텍합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주체로 일렉트로룩스가 1순위로 떠올랐다.
인수 대금 납입을 두 번 연기하는 등 인수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온 엔텍합과 달리 자금력이 풍부해 매각 작업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우일렉 매각에서 차순위협상자였던 일렉트로룩스는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가전제품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기업이다. 지난해에는 매출 147억6300만 달러(한화 약 16조7천억원), 영업이익 9억200만 달러(한화 약 1조2백억 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일본, 한국, 대만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아시아권에서 만큼은 유독 인지도가 낮다. 때문에 중동과 남미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공급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우일렉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실제로 경쟁 입찰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 일렉트로룩스는 애초에 제시했던 6000억원에 300억을 더 보태겠다며 강한 인수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인수 기업이 먼저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것은 M&A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업계 일부와 채권단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금융위기의 여파가 채 가라않지 않은 상황에서 일렉트로룩스 역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채권단 관계자는 "금융위기 등으로 전자업계가 전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금 유동성에서의 변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제3의 인수 의향 기업이 나타나는 것도 전혀 배제할 순 없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일렉트로룩스가 자금유동성 등의 이유를 들어 처음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애초 차순위협상자로 지정한 의미가 없어진다"며 "제3의 인수의향자와 경쟁 입찰을 다시 벌여야 하는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대우일렉' 브랜드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일렉트로룩스는 지난해 입찰 당시 대우일렉이라는 브랜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상 막바지에 다시 대우일렉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인수 후 조건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단독] 레거시 줄이고 첨단 메모리 집중… 삼성, 반도체 반등 시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1/20241121140830654754_258_161.jpg)

![[포토] 제8회 서민금융포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1/20241121114536531007_388_136.jpg)
![[포토] 기조연설 하는 페이커 이상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0/20241120115246771576_388_136.jpg)
![[포토] 발왕산은 벌써 겨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205226273772_388_136.jpg)
![[슬라이드 포토] 제44회 황금촬영상 시상식 참석한 스타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8/20241118194949259743_388_1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