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헤징(위험회피)에 나선 투자자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디폴트 리스크는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재정불량국들처럼 실질적인 지불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미 의회가 극적으로 디폴트 시한인 8월2일까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증액하면, 헤징에 따른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로이터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월가에서 미국의 디폴트 리스크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이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
| 최근 1주일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 추이(단위: %/출처: WSJ) |
스위스 은행인 사라신의 알레산드로 비 채권 투자전략가는 "대다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 의회가 (시한 내에) 부채협상에서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게 주된 시나리오였다"며 "때문에 투자자들은 현재 무방비 상태로, 지금 당장 미국의 디폴트라는 꼬리 리스크에 대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디폴트에 대비하는 것은 핵폭발에 대비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사라신에 따르면 가계와 연금펀드, 머니마켓펀드(MMF)의 투자 포트폴리오 가운데 미 국채와 연관된 자산은 1조8000억 달러로 전체의 20%에 달한다.
문제는 대책을 마련하려 해도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연금펀드와 MMF는 규제 때문에 미 국채와 같은 '트리플A(AAA)' 등급 자산에만 투자해야 하는데, 디폴트 사태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 연쇄효과로 미국에서는 더 이상 트리플A 등급의 투자처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설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의 디폴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월가에서는 논란만 일고 있을 뿐 어찌할 바를 몰라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까지 백악관과 의회의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지만,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안전자산'인 미 국채 수요로 이어져 시장에서는 미국의 디폴트에 따른 리스크를 과소평가했다는 설명이다.
WSJ는 특히 미 국채에 대한 투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폴트 위기로 미국의 '트리플A(AAA)' 신용등급이 위태로운 만큼 미 국채를 투매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동성이나 거래 규모 면에서 미 국채만한 투자처가 없고, 가격이 내리면 절호의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자렛 사이버그 MF글로벌 정책 애널리스트는 "(금융위기가 불거진) 2008년 가을을 경험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금융시스템이 기대만큼 튼튼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미국이 트리플A 등급을 잃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미 국채를 담보로 쓰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시장과 지방채시장 등 전방위로 확산될 충격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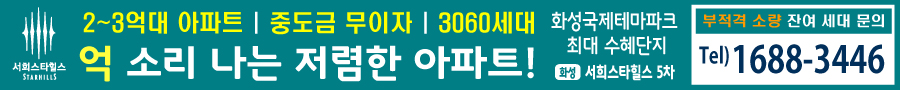







![[날씨] 포근한 주말…낮 최고기온 6∼14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5/20250215150405416291_258_161.jpg)
![[포토] 은으로 번진 골드바 품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6/20250216210750953390_388_136.jpg)
![[포토]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45226377542_388_136.jpg)
![[포토] 부산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장 화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25125795304_388_136.jpg)
![[포토] 하늘로 떠나는 하늘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25405185540_388_136.jpg)


![[ハルビンAG] 韓国フィギュア…キム・チェヨンに続きチャ・ジュンファン「シングル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3/20250213213430670456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