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은 “GM 같은 미국 기업은 대개 ‘신차 준비해 놨다. 오고 싶으면 와서 타라’인데, 현대차는 ‘꼭 오셔서 타 주십시오. 불편함 없게 하겠습니다’는 느낌이더라고”라고 했다. “기사야 기사대로 쓰는 거지만 응대법 그 자체로 현대차를 높게 평가한 기자도 꽤 있었어. 우리한테도 이러는 거 보면 고객 서비스도 좋지 않겠냐는 거지.”
꼭 좋게 볼 일만은 아니다. ‘기자’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라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기자 개개인의 호불호가 기사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언론계의 구습(舊習)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 있다. 기자가 이를 지적하자 지인은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다. “미국 기업의 홍보ㆍ마케팅 담당 직원들은 대개 취재 응대도 늦고, 불친절해. 미디어의 속보는 물론 인터넷 상에 고객의 각종 불만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한국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요컨대 양국(기업)의 문화 차이라는 것이다.
지인은 덧붙였다. “이런 부분이 요새 현대기아차가 미국서 잘 나가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요새 가격이 올라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 바꿔 말하면 예전엔 싼 맛에 샀는데, 지금은 가격을 올려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현대기아차는 지난 3월 미국서 월간 역대 최다인 12만7000여대(승용차 점유율 9.1%, 6위)를 판매했다. 지인이 그 때 타 본 벨로스터 역시 같은 기간 지난해 9월 출시 후 가장 많은 3848대가 판매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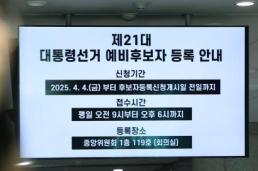



![[포토] 절정맞은 진해군항제 찾은 관광객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113133422560_388_136.jpg)
![[포토] 김두관 전 의원, 대선 출마 기자회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113005148545_388_136.jpg)
![[포토] 국민의힘 비대위원 회의 입장하는 권영세·권성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112758570412_388_136.jpg)
![[포토] 대구 산불 진화 헬기 추락…처참한 현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6/20250406200615522670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