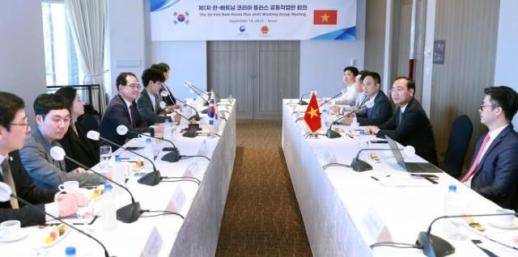지난해에는 청년층 가계소득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뒷걸음질쳤다. 40대와 더불어 가장 소비패턴과 쓰임새가 다양한 청년층이 소비를 줄여 연쇄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청년실업률을 낮추는데 애를 먹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제시한 청년고용 대책은 3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는 정책 방향마저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앞세운 3기 경제팀도 ‘청년 일자리’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의욕을 내비치지만 실제 효과를 얼마나 거둘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고용률(15∼64세)은 65.7%로 역대 최고치였다. 반면 청년(15∼29세) 실업률 역시 9.2%로 1999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 가장 높았다. 정부는 고용률이 올랐다고 평가했지만 결혼과 출산 등을 위해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층 반응은 냉담했다.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에서 놓치는 부분은 대학입학 후 시작되는 ‘대출인생’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조사한 지난해 20대 채무조정 신청자는 2014년 8090명에서 지난해 9519명으로 17.7% 증가했다.
대부분 청년층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을 제때 갚지 못해 발생한 것이 사회에 진출에서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송정훈(33·회사원)씨는 “대학을 졸업한지 10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다”며 “취업문은 좁은데 대출금 부담까지 겹쳐 요즘 대학가는 예전같은 활기를 찾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자리에 집중하기보다 경기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나치게 일자리에 집중하다보니 각종 지원책을 내놔도 현실에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의 청년 고용 대책 마련과 관련해 단순히 고용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건실한 고용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보완적인 수단일 뿐이고 가장 확실한 대책은 경기를 살려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고용 정책을 할지, 고용률 정책을 할지가 중요하다”며 “수치에 급급해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들면 한시적으로 취업자가 늘어나지만 몇 개월 되지 않다 실업자가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 구조로 이뤄졌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할 사다리가 없다”며 “이 때문에 청년들이 사회생활 처음부터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등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3∼5년씩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구조적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 눈 덮인 춘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7/20250207093943399163_388_136.jpg)
![[포토] 얼어붙은 부산 다대포해수욕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140208296534_388_136.jpg)
![[포토] 윤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 출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104019169180_388_136.jpg)
![[포토] 얼음 둥둥 떠다니는 한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5/20250205220625406252_388_1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