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 [사진=아주경제 DB]
불현듯 창조경제가 떠오른다. 박근혜 정부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구현하겠다는 취지에서 창조경제를 표방했지만, 창조경제는 정의 논란으로 1년 넘게 표류했다. 당시 정부도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데 매달렸다. 이 논란은 다음 해 창조경제를 대체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잠잠해졌다.
4차 산업혁명도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 과장된 표현임을 지적하고 있다. 무인자동차·인공지능은 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의 결과물이지, 새로운 패러다임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은 창조경제처럼 글로벌 트렌드를 정의하기 위해 외국에서 만든 용어다. 우리가 만든 용어가 아니다 보니 당연히 우리 문제를 풀어갈 열쇠도 없다.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 활용으로 세상의 흐름이 빠르게 바뀌고 있으니 우리도 혁신에 매진해야 한다. 이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
대신 소프트웨어를 기억하자.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에 대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했다. 연구개발도 사람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보다 대형 연구시설에 집착했다. 연구시설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협업이 안 된다는 점이다. 협업을 하려면 사람이 말과 글로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결과물에 대한 권리도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이 일을 주도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유영민 교수는 좋은 선택이다. 수학과 출신으로 프로그래밍을 했기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노파심에 조언을 하자면, 시류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정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당초 계획이 아닌, 발주처 공무원의 말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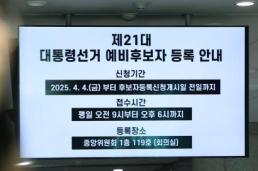



![[포토] 절정맞은 진해군항제 찾은 관광객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113133422560_388_136.jpg)
![[포토] 김두관 전 의원, 대선 출마 기자회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113005148545_388_136.jpg)
![[포토] 국민의힘 비대위원 회의 입장하는 권영세·권성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112758570412_388_136.jpg)
![[포토] 대구 산불 진화 헬기 추락…처참한 현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6/20250406200615522670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