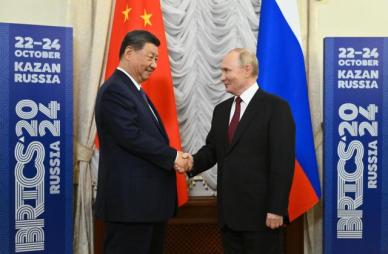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마림비스트인 전경호 씨는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소망과 장애인 아티스트로서의 어려움을 밝혔다. [사진=도미넌트 에이전시 제공]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마림바 곡들을 연주하고 싶어요. 그 많은 악보들은 작곡가들이 남긴 선물이거든요. 그걸 연주할 수 있는 건 행운이죠. 그래서 메시지를 잘 살려서 연주하고 싶어요. 마림바란 악기를 잘 몰랐던 사람들도 마림바를 사랑할 수 있게끔 하고 싶어요.”
시각장애인 마림비스트 전경호(30) 씨는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카페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국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마림바를 다루는 전경호씨의 목표는 명확했다. 자신의 연주를 통해 마림바를 널리 알리겠다는 것. 하지만 흔치 않은 악기의 악보를 구하는 것부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이 연습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마림바만큼 쉽지 않은 그의 아티스트로서의 삶을 들여다봤다.

[사진=도미넌트 에이전시 제공]
◆‘커다란 실로폰’ 마림바, 깊은 울림과 풍부한 소리가 매력
마림바는 나무로 된 건반들이 피아노와 같은 방식으로 배열된 타악기다. 실로폰의 일종이지만 실로폰에 비해 음역이 더 넓고 낮아 울림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는 아프리카 민속 음악기로 쓰이다가 현대음악기로 사용된 게 100년 밖에 안 됐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더 얼마 되지 않았다.
전 씨는 “커다란 실로폰이라고 보면 된다. 크니까 음도 더 많다. 실로폰이 흔히 동요나 영화 관련 뮤지컬에서 고음 쪽 소리를 낸다면, 마림바는 낮은 음역대의 소리를 낸다. 건반이 많으니까 소리가 풍부하고 울림이 깊다”고 마림바에 대해 설명했다.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마림비스트인 그가 마림바 채를 잡게 된 데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신체적 장애가 있었다. 그는 “다른 타악기 연주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선 오케스트라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지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건반 타악기 중에서도 마림바를 선택했다”고 마림바 연주 계기를 밝혔다.
학창시절 선생님의 권유도 전 씨가 마림바 연주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는 “고등학생 때 학교에 2년제 전문학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게 생겼다. 시각장애인 음악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었는데, 어려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고 그때 타악기 선생님을 만났다. 당시 타악기를 하려면 두 가지 숙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오케스트라였고 또 하나가 마림바였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사진=도미넌트 에이전시 제공]
◆떨렸던 첫 독주회…두 번째 주제는 ‘빛이 되는 소리’
전 씨는 ACCAC(Accessible Arts and Culture) 2017년 행사에 초청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ACCAC는 예술 문화의 접근성과 다양성을 위한 새롭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예술적 실천 모델들을 생성·소통·교류하는 국제적 프로그램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의 협력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씨는 “지난 8월 핀란드에서 열려 다녀왔다. 10월엔 이집트에서 다시 한 번 열리는데, 새로운 경험이었다. 많은 문화예술인뿐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류가 확산될 수 있는 기회였다. 핀란드 청중들도 예술에 대해 많은 걸 느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해에는 '드리밍 퍼커션'(Dreaming Percussion)이란 이름으로 첫 독주회를 열기도 했다. 이어 오는 9월 27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사운드 비컴즈 라이츠'(Sound becomes Lights)로 두 번째 독주회를 진행한다.
그는 “작년엔 첫 독주회라 많이 떨렸다. 일반 관객들이 많이 와주셔서 지인을 많이 모시진 못했다”면서 “이번엔 장소가 세종문화회관이고 객석도 많기 때문에 지인들을 많이 초대할 생각이다. 그동안 해왔던 음악들을 들려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공연은 아주 쉬운 클래식 음악으로 구성했다. 들으면 누구에게나 와 닿을 수 있는 곡들이다. 사실 마림바가 한국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연주곡들도 난해한 현대음악이다 보니 일반 관객이 악기의 매력을 느낄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 무대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곡들로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사진=도미넌트 에이전시 제공]
◆마림바 점자 악보 ‘하늘에 별 따기’…바이올린 점자 악보로 대신하기도
전 씨는 미숙아 망막증으로 태어났다. 조산 후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산소 과다 공급으로 실명에 이르렀다. 힘들지 않았냐는 기자의 철없고 동정 어린 질문에 “사람들 모두 힘든 점이 있지 않나. 힘듦의 차이일 뿐이다. 나만의 방식이 있다”고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장애인 연주자들에게 힘든 점은 악보를 구하는 일이다. 일반 연주자들과 달리 장애인 연주자들의 악보는 점자로 만들어야 한다. 점자뿐 아니라 음표와 기호를 아는 사람이 만든 악보여야 하다 보니 이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마림바 악보는 더 구하기 힘들어 그나마 비슷하고 구하기 쉬운 바이올린 악보를 대용하기도 한다.
연습 시간 역시 일반 연주자들보다 배로 걸린다. 전 씨는 “어느 예술 분야에서든 마찬가지겠지만, 덜 쉬고 더 노력해야 한다. 기술을 습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마림바 연주도 한 번 익히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한 곡을 하더라도 연습 과정이 배로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장애인 예술가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지만 때로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전 씨의 생각이다. 그는 “장애인 연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도 한다. 호기심으로 오는 것 같은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조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면서 “음악으로 보답하는 길 밖에 없다. 음악으로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민 삶의 질] 소득 낮을수록 크게 떨어진 만족도…안전·신뢰 모두 하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4/20250224102658406499_258_161.jpg)
![[포토] 배우 김새론 발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9/20250219121051906909_388_136.jpg)
![[포토]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KF-21 첫 시험비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9/20250219151445357011_388_136.jpg)
![[포토]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9/20250219120708811941_388_136.jpg)
![[포토] 윤석열 대통령, 헌재 출석 않고 구치소 복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8/20250218143715320315_388_1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