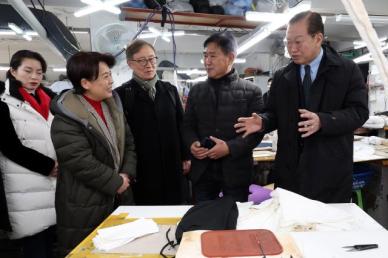[프로서핑 선수 전은경씨는 여자 서퍼의 로망인 긴 생머리가 아니다. 서핑 도중 물에 젖은 머리카락에 시야를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 과감히 머리를 짧게 잘랐다. 그녀의 단발머리는 양양 죽도해변에서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사진=서민교 기자]
한없이 고즈넉하던 바닷가 마을. 에메랄드빛 푸른 바닷물에 넘실대는 파도를 뒤로하고 낯선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작은 어촌 마을 한 곳에는 노인들이 직접 건진 해산물을 다듬고 있고, 그 곁을 젊은 서핑족들이 자연스레 인사하고 지나간다.
강원도 양양의 죽도(竹島) 해변. 이곳은 인구 네 명 중의 한 명은 65세가 넘는 초고령화 지역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젊은 세대들의 발길이 물길에 닿았다. 파도가 밀려오듯 끊이지 않는 그들의 손에는 서핑보드가 들려 있다. 이색적인 풍경은 어느새 강원도를 마치 대표적 휴양지인 발리로 탈바꿈시켰다. ‘서퍼들의 천국’으로 손꼽히는 낯설지 않은 양양의 바닷가 광경이다.
이곳의 유명인사는 여자 서퍼들의 우상인 현역 프로서핑 선수 전은경씨(42)다. 친구 소개로 서핑 체험을 한번 했다가 이곳에 터를 잡은 지 벌써 10년째다. 처음 서핑을 접했던 2009년에는 물놀이로 생각하고 왔다가 물만 먹고 떠난 뒤 이듬해 서핑보드에 몸을 싣고 서핑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이후 전씨는 국내외 굵직한 서핑대회를 휩쓸며 국내 최고의 여자 롱보더 서퍼로 우뚝 섰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에도 출연했다.
전씨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방인이었다. 지역주민들의 텃세에 눈칫밥도 많이 먹었다고. “처음엔 젊은 남자와 여자들이 벗고 막 돌아다니니까 할머니들이 싫어하셨다. 당연한 일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셨다.” 해변을 깨끗이 사용하면서 예의와 매너를 지켰고, 마을에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 도우며 이방인 딱지를 뗐다. 서핑족이 자리를 잡으면서 관광객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상권이 발달하면서 땅값도 올랐다. 전씨는 “여기선 인명사고가 한 건도 없으니 마을 주민들도 좋아하시더라”며 “지금은 김치도 챙겨주실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있다”고 웃었다.

[국내 최고의 여자 롱보더 서퍼로 자리잡은 전은경씨. 사진=서민교 기자]
양양은 죽도해변을 중심으로 ‘서핑 도시’가 됐다. 여름이면 젊은이들이 꼭 찾아야 할 축제의 도시가 됐고, 서핑 고수들은 사시사철 이곳을 찾아 더 높아진 파도를 만끽하고 있다. 3~4년 전부터는 서핑 붐을 타고 속초와 포항 등 타 지역까지 서핑 문화가 전파됐다.
하지만 전씨는 국내에 서핑 문화가 자리 잡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말한다. “지자체에서는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하시지만, 아직은 서핑 체험 정도를 하고 떠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강습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탓이다. 처음 경험하신 분이 매년 다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전씨는 프로선수로 활동하면서도 수입이 넉넉하지 않아 2~3개의 직업을 갖고 있다. 대회가 없을 땐 낮에는 서핑 레슨을 하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겨울에 해외 원정비용으로 쓰는 형편이다. 그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대부분 서퍼들이 투잡, 스리잡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그가 서핑을 하면서 가장 큰 소득은 행복이다. 그는 “예전엔 욕심도 많고 감정기복도 심했는데 지금은 바다와 서핑의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그런지 긍정적인 성격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전씨의 꿈도 소박했다. 그는 “패들링을 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서핑을 타고 싶다”며 “전 세계의 서핑 포인트를 모두 가서 파도를 느끼고 싶은 것이 꿈”이라고 미소지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민 삶의 질] 소득 낮을수록 크게 떨어진 만족도…안전·신뢰 모두 하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4/20250224102658406499_258_161.jpg)
![[포토] 배우 김새론 발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9/20250219121051906909_388_136.jpg)
![[포토]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KF-21 첫 시험비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9/20250219151445357011_388_136.jpg)
![[포토]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9/20250219120708811941_388_136.jpg)
![[포토] 윤석열 대통령, 헌재 출석 않고 구치소 복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8/20250218143715320315_388_1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