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기업부 신보훈 기자]
어릴 적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살던 기억이 난다. 블리자드의 역작인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가 출시되면서 전국에는 PC방 열풍이 불었고, 대부분 어른들이 그랬듯이 당시 부모님도 아들의 게임 중독을 걱정했다. 오랜 시간 컴퓨터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다 못해 선언한 ‘하루 2시간 이상 게임 금지’도 자식이 잘되길 바라는 선의에서 시작됐다. 게임 시간이 정해진 이후부터는 항상 아쉬움에 컴퓨터를 꺼야 했다. 눈치를 보지 않고 게임할 수 있도록 집에 혼자 있는 날만 기다린 것도 이때쯤부터였다.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한 시간제였지만, 돌이켜보면 게임에 대한 집착을 키우는 부작용을 만들어 냈던 것 같다.
주변을 둘러보면 선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일이 엉뚱한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 최근 중소기업계에서 뜨거운 감자인 주 52시간제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작년에만 202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65시간 길다.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긴 근로시간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는 녹록지 않다. 이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주 근무시간을 최장 52시간으로 한정하고, 국민들의 ‘워라밸’을 법적으로 챙겨주겠다는 의도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문제는 현실이다. 아무리 회식을 좋아하는 직원도 사장님이 옆자리에 앉아 “편하게 즐겨”라고 말하면 술을 마실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저녁이 있는 삶’을 싫어하는 직장인은 없지만, 52시간만 일하라고 강제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은 많다. 대표적인 업종이 제조업이다. 계약 기간 내 주문받은 상품을 생산해야 하는데, 시간은 항상 부족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을 더 뽑자니 여력이 안 되고, 추가로 채용하려 해도 고된 업무에 지원자가 없다. 애프터서비스(AS) 기술직들은 또 어떤가. 정규 근로시간이 지나더라도 기계 수리가 끝나지 않으면 일을 계속해야 한다. 시간 단위의 업무가 아닌 결과 단위로 하루 스케줄이 주어지는 직원들에게 주 52시간제는 사장님의 “편하게 즐겨”라는 말처럼 오히려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했다. 돈을 버는 직장인이기 이전에 쉼이 필요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절대선은 없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결과가 선하게만 나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도드라지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디테일이 필요하다. 특히, 변화의 흐름을 쫓아가기 버거운 중소기업에는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섬세함이 아쉽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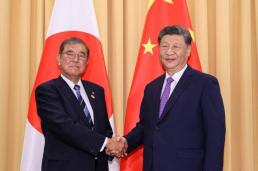
![[날씨] 아침 기온 0도 안팎 뚝…일교차 15도 내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3/20241123161702152439_258_161.jpg)
![[슬라이드 포토] 성수동이 들썩 오데마 피게 포토콜 참석한 스타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2/20241122205657914816_388_136.jpg)
![[포토] 제8회 서민금융포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1/20241121114536531007_388_136.jpg)
![[포토] 기조연설 하는 페이커 이상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0/20241120115246771576_388_136.jpg)
![[포토] 발왕산은 벌써 겨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205226273772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