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철 전 KOTRA 베이징·상하이 관장
그러나 냉정한 잣대로 이 지역을 살펴보면 우리 정부나 기업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결코 불리하지도 않다. 잘만하면 이 지역에서 우리의 이익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경쟁국들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프리미엄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는 선발주자인 일본이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전자·전기, 기계, 화학 등의 분야에서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일본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에는 중국도 적극적인 공세로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내수 시장이 부진한 것도 중국 기업들이 이 시장으로 방향을 트는 또 다른 원인이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미끼로 인프라 시장을 독차지하겠다는 포석을 바닥에 깔고 있기도 하다. 이 두 나라는 엄청난 자금 공세를 퍼부으면서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의 아시아 패권 의지를 좌절시키면서 이 지역 국가들이 중국으로 편향되는 것을 저지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의 국가들은 비동맹 노선을 견지하면서 특정 이념이나 패권 국가에 치우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한편으로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반사이익을 노리기도 한다. 일례로 안보는 미국 편에, 경제는 중국 혹은 일본 편에 서기도 하면서 실를 챙기기에 능수능란하다. 이런 이중적인 행보가 때로는 불이익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글로벌 경제가 중국에 극도로 기울어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외면당하는 뼈아픈 경험을 하기도 했다. 중국 경제가 패러다임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이 지역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기도 한다. 1990년 대 중반까지도 해도 우리 기업들은 중국보다 동남아 시장에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었다. 당시엔 베트남은 잘 보이지 않았고,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에 제조업은 물론이고 건설과 무역 분야에서 상당한 이익을 가져오기도 했다. 일본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도 이 시장에 대해 충분한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다. 다만 당시 세대들이 이제 거의 은퇴 연령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지만 일본·중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디테일이 필요
결국은 일본, 중국과의 3파전이다. 힘이나 자금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벌써부터 신(新)남방 정책을 두고 적잖은 말들이 나온다. 구체적 알맹이는 없고 구호만 거창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류(韓流)를 경제적 이익으로 잘 연결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에만 의존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일본·중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일본은 텃밭이라는 인식 하에 이익 사수에 전념할 것이고, 중국은 현지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통망 진입과 정부 커넥션을 통한 인프라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일본과는 거점 경쟁에서 업종과 국가가 겹치지 않으면서 시장을 나누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또한 이 지역 국가들이 미국·중국, 혹은 일본에게까지 보이고 있는 반(反)패권적 성향을 우리와의 호혜적인 협력 관계로 끌어내야 한다. 중국의 이기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곳곳에서 잡음이 생겨나고 있기도 하다.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지만 디테일이 있을 때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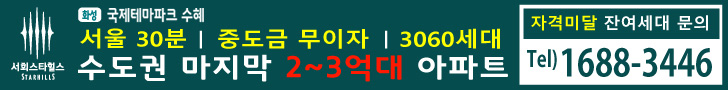








![[포토] 강동구에 대형 싱크홀 발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4/20250324211445495506_388_136.jpg)
![[포토] 최상목 부총리와 인사하는 한덕수 권한대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4/20250324131102934186_388_136.jpg)
![[포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복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4/20250324113047293971_388_136.jpg)
![[포토] 윤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 출석하는 윤갑근 변호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4/20250324114803323176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