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가 ESS 구성품과 시스템에 대한 실증 시험을 진행 중이며 6월 초에 조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2일 밝혔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장치다. 태양광과 풍력이 전기를 생산할 수 없을 때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던 ESS 산업은 '원인 모를' 화재로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5월 2일부터 지난 1월 22일까지 발생한 ESS 화재사고는 모두 20건에 달한다. ESS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1300개 사업장에 대한 안점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ESS에 대한 가동중단을 요청했고, 지난 1월 22일에는 민간사업장에도 별도의 전용 건물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가동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ESS는 화재 시 전소하는 특성이 있고 다수의 기업과 제품이 관련돼 사고원인을 과학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규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시험·실증을 조속히 완료해 6월 초 조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진 = 연합뉴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국내 ESS 신규 설치 발주는 사실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SS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주요 대기업은 올해 1분기 실적이 '반토막'이 났다.
삼성SDI 1분기 실적의 경우 영업이익이 1299억원으로, 전분기보다 52.2% 감소했다. 중대형 전지사업 부문에서 국내 ESS 수요가 부진했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다.
LG화학 역시 1분기 전지사업 부문에서 계절적 요인과 함께 ESS 화재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면서 적자를 냈다. 설비 점검과 가동손실 보상 등에 따른 충당금 800억원과 국내 출하 전면 중단에 따른 손실 400억원 등 ESS 관련 기회손실이 1분기에만 1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LS산전도 1분기 영업이익이 2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3%나 감소했다. ESS 신규 수주 급감에 따른 융합사업 부문의 실적 부진 탓이다.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은 ESS 설치 등을 맡아온 중소·영세 업체들이다.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
ESS 관련 중소기업 관계자는 "ESS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을 끌어와 사람을 모으고 장비를 구비했지만 수주가 없어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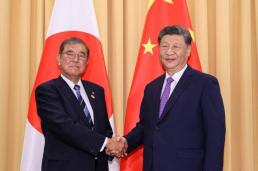
![[날씨] 아침 기온 0도 안팎 뚝…일교차 15도 내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3/20241123161702152439_258_161.jpg)
![[슬라이드 포토] 성수동이 들썩 오데마 피게 포토콜 참석한 스타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2/20241122205657914816_388_136.jpg)
![[포토] 제8회 서민금융포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1/20241121114536531007_388_136.jpg)
![[포토] 기조연설 하는 페이커 이상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0/20241120115246771576_388_136.jpg)
![[포토] 발왕산은 벌써 겨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205226273772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