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일로에 놓인 한국경제에 이번 추경은 0.1% 포인트가량 성장률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이 하향조정되는 가운데 하락속도를 늦추는 게 문재인 정부의 당면과제일 수밖에 없다.
둔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주도적으로 시장의 판세를 이끌어갈 수도 없다. 내리막길 수출 실적을 단기간에 키우기도 쉽지 않다.
여기에 내수 역시 불안하다.
민생경제에 벌써부터 찬서리가 내리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도 잘 안다. 그래서 여야 구분 없이 '민생경제 살리기'에 목소리를 높인다. 다만, 방법론에서 180도 다를 뿐이다.
여권은 '추경 절대론'을, 야권은 '추경 무용론'을 주장한다. 이러다 보니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달이 다가오도록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물론,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실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양치기 소년'이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그만큼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정치권은 물론, 국민에게 주지 못한 것이 아쉽다.
야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민생경제가 중요하다면, 한달 동안 치열하게 추경안을 심의하고 설득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추경'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모습에 한 경제학자는 역발상(逆發想)으로 야당이 추경 세부안을 추가로 정해서 먼저 내놓고 정부가 따를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민생을 위한다면, 제 능력을 충분히 활용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추경을 여권의 선거자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못한다면, 이들에겐 '민생경제 패싱'이 어울린다. 총선이 신경쓰인다면, 국민의 체감경기를 높이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조속한 추경 처리도 필요하겠지만, 실효성 높은 추경 투입 설계를 위해 '올인'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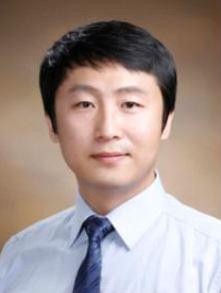
이경태 경제부 기자[아주경제 자료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날씨] 식목일 전국 흐리고 봄비…벚꽃 구경 미루세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01304361444_258_161.jpg)
![[포토] 윤석열 탄핵...희비 엇갈리는 서울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20551628427_388_136.jpg)
![[포토] 헌재 출근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091023113829_388_136.jpg)
![[포토] 통제되는 헌법재판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091124425400_388_136.jpg)
![[포토] 긴장감 도는 헌법재판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222308519627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