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은 30일 경주 금령총 2차 재발굴조사 결과 말 모양 토기가 출토됐다고 밝혔다.
국립경주박물관은 8일 경주 금령총 2차 재발굴조사 성과를 일반에 공개한다. 박물관은 지난 4월부터 속개한 이번 조사는 작년 1차 조사에서 확인한 호석의 전모를 밝히는데 집중해, 기존에 지하식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묘)으로 알려진 금령총의 구조가 지상식임이 밝혀졌다며 금령총의 규모도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금령총은 일제강점기(1924년) 당시 이미 일부 훼손된 봉토와 적석부를 걷어내고 매장주체부만 조사하여 호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1차 조사에서 평면상 존재가 확인됐고, 이번 조사로 그 전모가 드러났다. 호석은 기반층 위에 바로 설치했고, 2단 구조에 너비 약 1.3~1.5m, 높이 약 1.6m 규모다. 이를 기준으로 금령총의 직경은 종래에 알려진 크기보다 8m 가량이 더 큰 28m 내외로 지상식 적석목곽묘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박물관은 밝혔다.
말모양 토기는 높이 56㎝로 지금까지 확인된 것 중 가장 크고, 일제강점기에 수습된 국보 제91호 기마인물형토기와 제작 기법이 거의 동일하다.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나 얼굴과 턱·목·발굽 등 각 부위를 정밀하게 표현한 점, 실제 말의 비율에 가깝게 제작된 점 등은 차이를 보인다. 현재는 머리와 앞다리 쪽만 확인됐고, 등과 배 부분이 깔끔하게 절단된 듯한 흔적이 보여 의도적으로 깨뜨려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봉토와 호석을 갖춘 옹관묘(127-1호)를 비롯해 적석목곽묘 2기(127-2호, 127-3호), 소형 분묘(127-4호) 1기 등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무덤 4기가 새로 발견됐다. 그동안 왕실 묘역으로 알려진 대릉원 일대는 중심 고분 주변으로 소형분들이 다수 확인되는 쪽샘지구와는 양상이 다를 것으로 인식됐다. 이번 조사로 마립간기 지배계층의 묘역 공간 구획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게 됐다고 박물관측은 설명했다.
고분 주변의 층위 양상을 파악한 결과, 현재 지면보다 약 2m 아래에서 5~6세기 신라 문화층이 확인돼 주변 경관이 현재와는 크게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향후 식리총을 비롯한 노동동 고분군 일대에 대한 조사 및 복원·정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박물관은 밝혔다.
박물관은 내년 3차 조사에서 매장주체부까지 확인하면 금령총의 전체 구조 및 축조기법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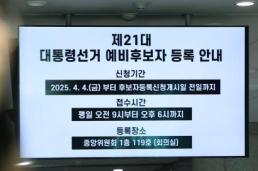



![[포토] 절정맞은 진해군항제 찾은 관광객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113133422560_388_136.jpg)
![[포토] 김두관 전 의원, 대선 출마 기자회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113005148545_388_136.jpg)
![[포토] 국민의힘 비대위원 회의 입장하는 권영세·권성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112758570412_388_136.jpg)
![[포토] 대구 산불 진화 헬기 추락…처참한 현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6/20250406200615522670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