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그렇다고 무작정 소상공인에 비판의 화살을 돌릴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부닥친데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각종 세금과 임대료 등 돈 나갈 일은 태산인데, 손님의 발길은 뚝 끊겼다. 지난 10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매출액이 0원이라고 답한 소상공인은 전체 응답자의 15.8%에 달한다. 직접대출로 1000만원이라도 마련해야 간신히 일터를 지킬 수 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힘겨운 몸부림이다.
이는 그간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코로나19로 일시에 터진 문제다. 소상공인은 소비자를 직접 마주하는 시장 최전선에 있으며 그 비중도 크나, 경제 영역에서는 변방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OECD 평균인 15.3%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그럼에도 소상공인 정책은 최근까지 중소기업 정책의 일부로만 다뤄졌다. 기본법도 막 마련된 참이다. 정책적 고려가 미비했기에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지금 당장의 대출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 지원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전국 소상공인은 630만명가량인 반면 소진공 직원은 600명이다. 이에 대해 소진공 관계자는 "직원 1명당 1만명을 담당하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제아무리 뛰어난 직원이라도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업2부 오수연 기자.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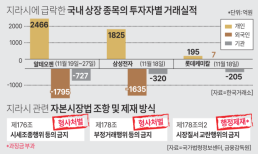
![[2024 스마트대한민국대상]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디지털 전환은 곧 생존과 도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100558328826_258_161.jpg)
![[단독] 저축은행 사태 투입한 공적자금···정리도, 회수도 어렵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134144932955_258_161.jpg)

![[포토] 눈 쌓인 덕수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082949997862_388_136.jpg)
![[포토] 화성시 화재현장 합동감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6/20241126123450357646_388_136.jpg)
![[포토]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5/20241125145229136612_388_136.jpg)
![[포토] 법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5/20241125140609985611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