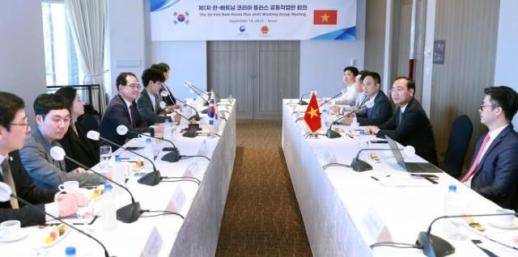1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신용평가사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08년 12월~2015년 9월 B사의 한 지점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며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퇴직하면서 "B사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해왔지만 실질적인 업무 내용에 비춰 종속적 근로관계를 맺어왔다"며 퇴직금 32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1·2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라며 "B사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2심도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체결된 계약 형식과 달리 실제로는 A씨와 B사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 관계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회사는 채권추심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각종 업무상 지시, 관리기준 설정, 실적관리 및 교육 등을 함으로써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비록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며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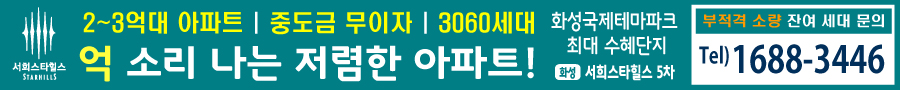








![[날씨] 전국에 눈, 충남 적설량 15cm이상…아침 최저 -14도 강추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193010766004_258_161.jpg)
![[포토] 눈 덮인 춘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7/20250207093943399163_388_136.jpg)
![[포토] 얼어붙은 부산 다대포해수욕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140208296534_388_136.jpg)
![[포토] 윤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 출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104019169180_388_136.jpg)
![[포토] 얼음 둥둥 떠다니는 한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5/20250205220625406252_388_1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