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 정부 부처 공무원의 푸념이다. 고위 공무원을 필두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가 확산하고 있다. 윗선에서부터 기부에 나서면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기부에 나섰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기부 의사를 밝혔다.
자발적 기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는 셈이다. 이렇게 기부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 특별법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쓰인다.
그런데 공무원 내부 분위기는 싸늘하기 그지없다. 이 기부가 고위 공무원으로 끝나지 않고 과장급 이상의 간부에게 '자의'에 따라 기부를 독려하고 있어서다. 말이 자의지 사실상 강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직 기부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부처는 열심히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경제부처 과장은 "아직 내부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대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아서 눈치를 보고 있다"며 "우선 지원금을 사용한 후 기부 기준이 세워지면 자비로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여간 억울한 게 아니라고 한다. 코로나19로 업무가 예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는데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연가 보상비가 전액 삭감됐다. 이런 마당에 긴급재난지원금까지 기부하자니 가족들 볼 면목이 없다고 토로한다.
그렇다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온전하게 공무원 본인의 것이 아니다. 국민 개개인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됐기 때문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씩 지급됐다.
공무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라는 것은 공무원 가족들 몫까지 내놓으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부처 공무원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것 같다"면서 "아내와 아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미 사용했다면서 기부해야 하면 아빠 몫만 하라고 엄포를 놨다"고 전했다.
기부한 사람에게 박수하는 것은 자유다. 기부가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손가락질받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엄연한 경제 정책이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해서 재원을 마련했다.
핵심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돈이 돌게 하고, 각 가계의 살림에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이다. 기부가 아니라 돈을 적극적으로 쓰는 게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지급한 돈을 기부로 유도하는 것은 정부의 자가당착과 다름없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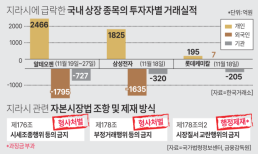
![[2024 스마트대한민국대상]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디지털 전환은 곧 생존과 도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100558328826_258_161.jpg)
![[단독] 저축은행 사태 투입한 공적자금···정리도, 회수도 어렵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134144932955_258_161.jpg)

![[포토] 눈 쌓인 덕수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082949997862_388_136.jpg)
![[포토] 화성시 화재현장 합동감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6/20241126123450357646_388_136.jpg)
![[포토]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5/20241125145229136612_388_136.jpg)
![[포토] 법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5/20241125140609985611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