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홍콩 문제까지 전방위로 충돌하는 가운데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최근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논란'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싱 대사는 24일 저녁 관영 중국중앙(CC)TV가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맞아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 홍콩의 범죄인 송환법 사태 이후 홍콩의 반중파는 외부 세력과 결탁해 왔고, 그들의 폭력 테러 활동 수위는 더 높아졌다"며 "이에 홍콩 법치가 훼손됐고, 사회 안정도 파괴됐으며 경제와 민생도 큰 타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 제정으로 홍콩의 혼란을 해결하려는 것은 잠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싱 대사는 이번 전인대가 홍콩보안법 마련으로 혼란한 정국을 해결하려는 것과 관련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위안을 받았으며 강력한 지지를 표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홍콩의 안보를 위한 법적 제도와 집행 체제를 마련하기로 한 것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홍콩에서 실현되고, 홍콩이 조속히 정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홍콩이 장기적으로 번영하고 '동방명주'의 빛을 다시 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존중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싱 대사는 "한·중 양국은 전통적으로 핵심 사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온 우호국"이라면서 "홍콩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우리는) 한국 친구들에게 홍콩보안법의 배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개하려 한다"며 "한국이 이에 대해 이해와 지지를 보낼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미·중 갈등이 격화된 이후 중국이 공개적으로 한국에 지지 입장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홍콩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맞서 홍콩인들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웃나라 한국과의 우의를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우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한다면 대(對)중국 제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재차 경고하며 법 제정 추진 중단 압박을 이어갔다.

싱 대사는 24일 저녁 관영 중국중앙(CC)TV가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맞아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 홍콩의 범죄인 송환법 사태 이후 홍콩의 반중파는 외부 세력과 결탁해 왔고, 그들의 폭력 테러 활동 수위는 더 높아졌다"며 "이에 홍콩 법치가 훼손됐고, 사회 안정도 파괴됐으며 경제와 민생도 큰 타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 제정으로 홍콩의 혼란을 해결하려는 것은 잠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싱 대사는 이번 전인대가 홍콩보안법 마련으로 혼란한 정국을 해결하려는 것과 관련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위안을 받았으며 강력한 지지를 표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존중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싱 대사는 "한·중 양국은 전통적으로 핵심 사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온 우호국"이라면서 "홍콩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우리는) 한국 친구들에게 홍콩보안법의 배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개하려 한다"며 "한국이 이에 대해 이해와 지지를 보낼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미·중 갈등이 격화된 이후 중국이 공개적으로 한국에 지지 입장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홍콩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맞서 홍콩인들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웃나라 한국과의 우의를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우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한다면 대(對)중국 제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재차 경고하며 법 제정 추진 중단 압박을 이어갔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사진=주한중국대사관 웨이보 캡처]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날씨] 전국 흐리고 눈비…강원·경기·충북·경북북부 많은 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3/20250303060753825228_258_161.jpg)
![[중국 화양영화] 로봇과 사람 이야기 中 자장커가 AI로 만든 첫 영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8/20250228154022354419_388_13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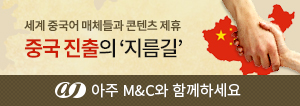
![[포토] 연극 관람하는 한동훈 전 대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2/20250302140615774122_388_136.jpg)
![[포토] MWC 2025 현장홍보 나선 KT](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2/20250302140759874004_388_136.jpg)
![[포토] 야 5당, 탄핵 촉구 집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1/20250301163630356851_388_136.jpg)
![[포토] 삼일절 광화문 탄핵 반대집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1/20250301163821199467_388_136.jpg)
![[중국 화양영화] 로봇과 사람 이야기 中 자장커가 AI로 만든 첫 영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8/20250228154022354419_518_323.jpg)

![[속보] 中증시, 하락 마감…상하이 1.98%↓ 선전 2.89%↓](https://image.ajunews.com/images/site/img/ajunews/list_noimg.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