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연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7/18/20200718124854802903.jpg)
[사진=연합]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이 연체 상황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금리는 ‘대출금리+3%’다. 2018년 4월 일괄적으로 3%로 조정한 뒤 단 한 번도 변화가 없었다.
문제는 이후로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꾸준히 이어졌다는 점이다. 은행들이 연체 금리를 3%로 결정짓던 당시 1.5%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0.5%까지 떨어졌다. 이를 반영해 예·대출 금리도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렸지만, 연체금리만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이를 두고 은행의 대표적 ‘꼼수 영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대출과 달리 연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가 적은 점을 이용, 추가 인하를 단행하지 않았단 주장이다.

이는 보험, 대부업 등 타 업권과도 동일한 수준이다. 해당 업권들의 연체 금리도 3%로 같다. 업계에선 이 점을 꼬집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1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은행 금리가 2·3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는 최근 은행들이 강조하고 있는 ‘상생’ 측면에서 크게 벗어난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들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그러나 금융 취약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집중되는 ‘연체금리’의 조정 없이, 명목적 지원만 반복하는 건 결국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연체 금리 인하 기조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앞서 이달 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 학자금 연체 금리의 추가 인하 계획을 내놨다.
김경환 성균관대 주임교수는 “취약연체차주 지원 및 업권 특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은행의 연체금리 추가 인하는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은행들은 현재의 연체금리가 현실적으로 조정 가능한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다. 연체 위험관리, 수익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추가 인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3%의 연체 금리가) 영업 상황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타 업권에서는 아직 추가 인하 여력이 충분이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A 대부업체 대표는 “은행과 대부업은 자금 조달을 비롯한 수익 구조에서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은행의 현재 금리가 마지노선이라면 보험, 대부업 등 타업권은 이미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아직까지 은행의 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남아 있다는 뜻이 될 것”이라며 “(추가 인하는) 업권 구분 차원에서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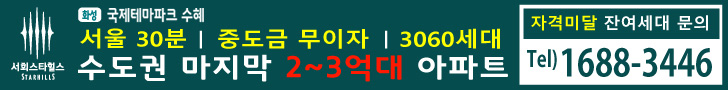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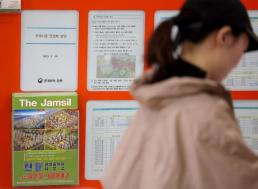



![[포토] 의성 산불 현장에 투입된 산림청 헬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3/20250323145532371669_388_136.jpg)
![[포토]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열차 탈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3/20250323145409699810_388_136.jpg)
![[포토]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심사 출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1/20250321114715242340_388_136.jpg)
![[포토]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63750301534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