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중국 경기 회복세로 산업용 전력 수요 급증,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한파, 석탄 재고 부족 등으로 빚어진 것이다. 일부 외신에서는 최근 호주와 갈등을 빚는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결과라는 보도도 흘러나왔다.

중국 곳곳서 전력난. [사진=웨이보]
◆ "3도 이하 난방 금지" 곳곳서 전력제한령···'블랙아웃' 현상도
중국 온라인매체 제멘망 등에 따르며 이우를 비롯한 저장성 일대는 연말까지 벨브를 틀어 잠그고 전력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라자셴뎬(拉閘限電)’ 조치에 돌입했다.
후난성, 장시성, 네이멍구 등 지역도 마찬가지다. 후난성의 경우, 이미 지난 8일부터 전력 이용 제한령에 돌입했다.
후난성 당국은 최근 겨울철 전력 사용 관련 긴급 통지를 발표해 매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4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는 일반 가정과 공공시설, 중점 기업에 전력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후난성 성도 창사시의 경우, 시 전체 실내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낮추게 하고, 전기난로 등 소비 전력량이 높은 전력기기 사용도 금지했다.
갑작스럽게 전력 공급이 끊기는 '블랙아웃' 사태도 벌어졌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광둥성 광저우에서는 지난 21일 일부 지역에서 한밤중 약 2시간 가까이 정전 사태가 빚어졌다고 홍콩 명보 등이 보도했다. 집집마다 정전이 된 것은 물론 가로등 불마저 꺼져 도시 전체가 암흑으로 변했다.
이에 대해 광저우시 당국은 "설비 고장으로 인한 정전"으로 "광저우시 전체 전력공급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전력난으로 빚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중국 곳곳의 전력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빗발치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도 부랴부랴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발개위는 지난 17일 "이번 전력난이 산업생산 증가와 저온현상, 게다가 전력 수요 급증으로 빚어진 것"이라며 "주민들의 생활 전력 이용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관련 부처와 기업에 조치를 취해 전력 수요를 보장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 일찍 찾아온 한파, 경기 회복세로 공장 풀가동 등이 이유
중국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난이 초래된 배경은 복합적이다.
우선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한파다. 특히 후난성·장시성 등 일대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로 주민들의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난이 빚어졌다는 분석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후난성 전체 실시간 최대 전력 부하량이 3093만 킬로와트(kW)로 역대 겨울철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루 최대 전력사용량은 6억600만 kW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해 매일 1000만~2000만 kW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 경기 회복세로 산업용 전력 수요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저장성의 경우가 그렇다.
동부 해안에 위치한 저장성 일대 수출업체들은 최근 해외 주문이 폭발적으로 쏟아지면서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는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전 세계 공장 가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으로 해외 주문이 몰린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올해 11월 저장성 수출액이 2381억6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력 사용량은 급증한 반면, 최근 중국에서 석탄 생산량 증가세는 차츰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지도부가 지난 2016년부터 공급 측 개혁을 통해 석탄산업의 공급과잉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중국 전국 석탄 생산량은 3억500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전력사용량 증가율이 9.4%에 증가한 것에 크게 못 미친다.
◆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가 초래한 전력난?
최근 중국 전력난이 빚어진 게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데 따른 결과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중국 당국은 사실이 아니다고 적극 부인하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 편집장 후시진은 "악의적 날조"라며 "호주에서 수입하는 석탄은 발전용 석탄이 아닌 주로 코크스인 데다가 중국의 석탄 수입량도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국가통계국 수치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의 석탄 생산량은 37억5000만톤인 반면, 수입 석탄량은 3억톤에 불과하다며 특히 호주산 석탄 수입량은 7700만톤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단독] 레거시 줄이고 첨단 메모리 집중… 삼성, 반도체 반등 시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1/20241121140830654754_258_1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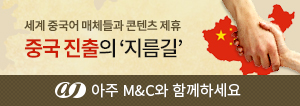
![[포토] 제8회 서민금융포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1/20241121114536531007_388_136.jpg)
![[포토] 기조연설 하는 페이커 이상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0/20241120115246771576_388_136.jpg)
![[포토] 발왕산은 벌써 겨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205226273772_388_136.jpg)
![[슬라이드 포토] 제44회 황금촬영상 시상식 참석한 스타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8/20241118194949259743_388_136.jpg)








![[속보] 김정은 美와 협상, 갈 데까지 가봐…적대적 대조선정책 확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2/20241122070112632356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