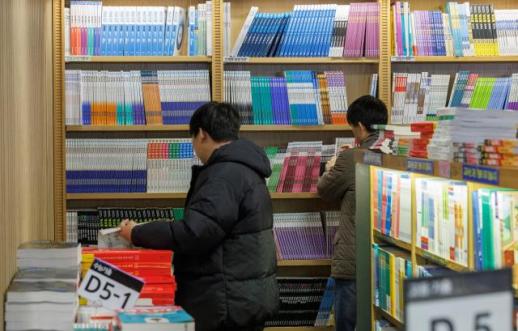[사진=아주경제 미술팀]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33.2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환율이 1130원대에 마감한 건 작년 11월 4일 이후 최초로, 약 넉 달 만이다. 여기엔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와 실업률이 일제히 개선된 게 영향을 미쳤다. 앞서 미 노동부는 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37만9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실업률도 6.2%로 전달 6.3%에서 하락했다. 이에 뉴욕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는 곧 달러 강세 현상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변동 폭이다. 당장 이날만 해도 7.1원이 올랐다.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훨씬 넘어선 수치다. 지난주에도 일 평균 6~7원 수준의 높은 변동 폭을 보였다. 일례로 지난 2일 개장가는 전일보다 6.5원 하락했고, 반대로 5일의 경우 6.9원이 올랐다. 그럼에도 지난주의 전체 상승 폭은 2.5원에 그쳤다. 환율이 얼마나 뚜렷한 방향 없이 빠른 속도로 치솟았다가 급락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지난달 26일 상승 폭은 15.7원으로 작년 3월 23일(20원 상승)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향후 상황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의 예측 방향과 환율의 실제 전개 방향이 대립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까지 ‘약 달러’ 현상이 지속될 것을 점쳤으나 상황은 반대로 흘러갔다. 달러 강세가 가시화된 이후에도, 금방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회복되며 약세 전환이 이뤄질 거란 시각이 우세했지만, 실제로는 4주 연속 상승했다. 그만큼 현 상황에서 단기 내 환율 흐름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외환시장의 피로도 가중되고 있다. 적정 수준의 변동성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지만, 환율의 지나친 급등락은 시장에 피로감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글로벌 투자자 시각에서 원화에 대한 신뢰도를 깎아 먹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주문하는 요구도 있다. 외환업계 관계자는 “환율 변동은 손익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요인”이라며 “각 경제주체들은 환율 변동요인을 점검해 보고 환율위험 관리 방안을 세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MWC 2025] AI와 연결성 중심의 혁신 기술 대거 공개…韓 187개 기업 참가, 관도 총출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4/20250304062825197030_258_161.jpg)


![[포토] MWC25 개막, 북적이는 전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3/20250303213356819887_388_136.jpg)
![[포토] 미국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 입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3/20250303151556769267_388_136.jpg)
![[포토] 봄 시샘하는 겨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3/20250303123816546792_388_136.jpg)
![[포토] 연극 관람하는 한동훈 전 대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2/20250302140615774122_388_1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