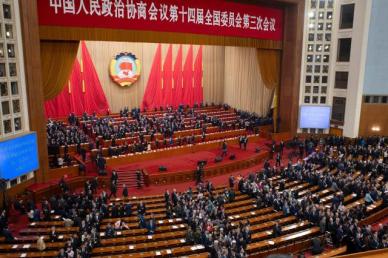고윤기 법무법인 고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고우]
그런데 ‘비재무적 지표’라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ESG를 미래의 지속가능한 기업을 위한 요소가 아니라 ‘규제’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의 규제에 추가된 또 하나의 규제로 본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ESG 경영을 외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최대한 ESG 문제와 엮이는 것을 피하려고만 한다.
언론과 정부에서는 한국형 ESG를 외치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 ESG의 각 요소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수치화할 것인지,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자본이 충분한 대기업들은 해외의 기준과 사례를 따라서 ESG 경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처지에서는 대책이 없다. 앞으로 정부 입찰 등에서 ESG를 평가한다는 뜬소문까지 돌고 있어,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필자는 지금까지 많은 기업과 연예인의 악플, 평판 등과 관련한 사건을 진행해 왔다. 기업에 불리한 내용은 인터넷을 타고 발 없는 말이 되어 급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처를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도 기업 평판관리의 일종인데,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하는 사후조치에 불과하다.
지금까지는 기업과 관련한 언론에서 주목되는 사고, 소송 등이 없으면, 사회적 평판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다. 즉 기업에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딱히 기업이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관리하지 않아도, 평판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ESG라는 지표가 실제 기업평가에 활용되고, 계약 등에 반영이 된다면, 달라질 것이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기업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올해는 정부 차원에서 한국형 ESG의 기준이 구체화 될 가능성이 높다. ESG라는 개념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보일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 취재진 앞에 선 심우정 검찰총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0/20250310102750717835_388_136.jpg)
![[포토]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8/20250308184125904799_388_136.jpg)
![[포토] 윤석열 대통령, 52일만에 관저로 복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8/20250308184242645541_388_136.jpg)
![[포토] 검찰에 즉시 항고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8/20250308142539912528_388_136.jpg)




![[홈플러스發 마이너스의 손] 사모펀드, 모럴해저드 재점화… 투자자만 피눈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0/20250310184021762986_388_1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