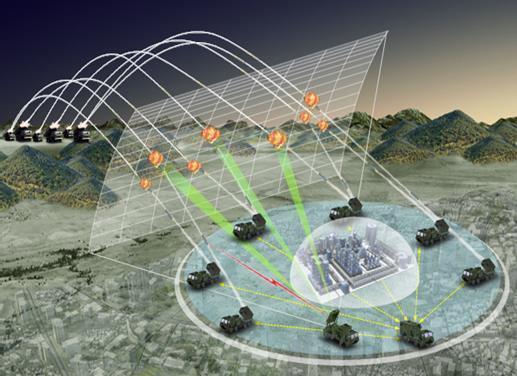당초 7월로 예정됐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일이 돌연 두 달 연기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해당 정책 3단계 시행일도 내년 초에서 내년 7월로 연기되면서 관련 우려가 커지는 형세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심사를 강화해 가계대출 증가 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에 가산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를, 내년부턴 가산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계대출을 제어해야 할 해당 정책들이 미뤄지면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당분간 대출 규제 고삐를 강하게 조이지 않겠다는 시그널로 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당국은 스트레스 DSR 연기가 대출에 기반한 '집값 띄우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 발표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과 자영업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못 박았다.
다만 금융권 내부에선 급증하는 가계부채 수요에 우려를 하지 않으려 해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특히나 오는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앞두고 미리 대출받으려는 수요도 몰리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5723억원으로 지난 5월(703조2308억원)보다 5조3415억원 늘었다. 한 달 새 6조2009억원 증가한 2021년 7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큰 모습을 보였다.
더 큰 문제는 당국의 모순된 정책이 병행되면서 올해 가계부채 부실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다는 점이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움직임과 맞물려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대환대출 서비스와 정책모기지 등을 활성화하고 있는 점도 관련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여기에 전셋값 상승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점도 악재로 꼽힌다. 최근에는 국내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하단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2%대까지 내려앉기도 했다.
당국이 어떤 이유를 대든 이번 스트레스 DSR 2·3단계 추진 연기는 가계대출을 더 늘리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에 대한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정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 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은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시장의 불신만 조장할 뿐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 출입통제 강화된 서부지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0/20250120122826643442_388_136.jpg)
![[포토] 영화 미키17 기자간담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0/20250120122907187615_388_136.jpg)
![[포토] 습격당해 외벽 파손된 서부지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19/20250119095353763205_388_136.jpg)
![[포토] 뒷문으로 공수처 안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15/20250115113321655655_388_1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