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자주 잊지만, 올여름 극단적인 폭염의 파고를 넘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임계점도 함께 넘는다는 느낌만은 강하게 남았다. 이에 대해 환경문제에 큰 관심 없어 보였던 분들께서도 대다수 공감해 주시는 것이 더 놀라웠다. 조금 식상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행동하지 않는다면 결국 위기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일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가꾸는 건 탄소 흡수량을 늘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분명한 대책이다. 회색 공간에 새로운 정원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기존 녹지에 큰 나무들만 덩그러니 자라 하부에 맨땅이 드러난 곳에 새로 만드는 정원도 무척 효과적이다. 큰 나무 아래로 다양한 꽃을 가진 키 작은 나무들과 야생화를 추가로 심으면 전체적인 잎의 면적이 늘어나 탄소를 더 흡수하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점은 맨땅이 식물로 피복되는 효과인데, 이는 지구 전체 땅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2700기가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막고, 나아가 식물의 뿌리를 통해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땅이 저장하여 비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원을 가꾸는 일은 식물과 토양을 통해 탄소를 저감하고 또 저장하는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이다.
작년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도시 서울’을 발표한 뒤 서울시는 정원 확대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큰 나무만 듬성듬성 있던 뚝섬한강공원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거치며 ‘뚝섬대정원’으로 완전히 바뀌는 등 9월 말까지 서울시 주요 공원과 가로, 자치구별 주요 결절점마다 269개소 12만㎡의 매력정원이 만들어졌다. 내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 보라매공원이 ‘서남권 대정원’으로 탈바꿈하는 등 2026년 말이면 1007개소 131만㎡의 매력정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이쯤이면 시민 누구나에게 정원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끼실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전략은 서울시의 노력에 더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뚝섬 정원박람회만 해도 9개 기업이 7460㎡의 정원을 가꾸는 데 23억원을 기부해 주셨다. 시 예산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기후위기 시대 기업의 사회공헌 중 숲과 정원을 만드는 것만큼 효과적인 사업은 많지 않다. 시민의 참여도 중요하다. 1년 반 이상 교육을 받은 시민정원사 756명은 정원박람회장 유지관리를 비롯해 시 전역에서 열심이시다. 양천구, 노원구, 영등포구, 성동구에서는 이미 마을정원사를 별도로 양성해 운영 중이고 광진구, 구로구 등도 준비 중이다. 시민정원사와 마을정원사를 연결하는 거점공간인 정원힐링문화센터도 서울시 주요 공원과 자치구별 거점공원에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기후위기라는 큰 파고는 정원도시를 통해 극복되어야 하며, 이는 위기를 인식하는 것부터 실천에 나서는 전 과정에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서울시도 시민들에게 정원을 가꿀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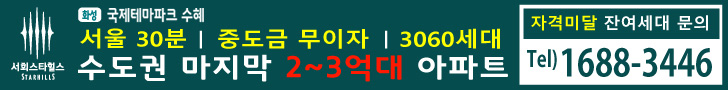









![[포토] 강동구에 대형 싱크홀 발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4/20250324211445495506_388_136.jpg)
![[포토] 최상목 부총리와 인사하는 한덕수 권한대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4/20250324131102934186_388_136.jpg)
![[포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복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4/20250324113047293971_388_136.jpg)
![[포토] 윤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 출석하는 윤갑근 변호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4/20250324114803323176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