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가 개발한 어플과 플랫폼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자체 역량 부족 등 한계에 막혀 데이터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사업 전체가 ‘껍데기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2020년 인천을 시작으로 수원, 대구, 울산, 청주, 경주, 양양, 남원, 여수, 인제, 용인, 통영 등 총 12개 도시를 스마트관광도시로 지정했다. 해당 도시에는 총 600억원이 넘는 국비가 지원됐다.
스마트관광도시는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관광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지역 콘텐츠와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실제 사업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어플 설치 수, 플랫폼 접속률, 데이터 분석 결과 등 핵심 성과지표는 비공개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수치는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 초기 각 도시에는 전용 어플과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됐지만, 이후 운영·활용 측면에서는 지자체별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주도, 민간위탁 방식의 한계와 더불어 지자체 내부 전문 인력 부족, 지속 가능한 예산 구조 부재 등의 근본적 문제도 드러났다.

인천의 ‘인천e지’는 인공지능(AI) 여행 추천, 스탬프 투어, 오디오 가이드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자 수가 적고, 기능 고도화도 사실상 멈춘 상태다. 수원의 ‘터치수원’은 XR버스, AR·VR 콘텐츠 등 체험형 기능이 강점이지만 사용자 피드백 기반의 콘텐츠 개선은 정체돼 있다. 예산 부족과 민간 위탁 구조도 사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구의 ‘대구트립’ 어플은 시티투어, 숙박 예약, 항공 연계까지 통합 서비스를 시도했지만, 어플 내 데이터 적재량이 부족하고 기술적 오류가 반복된 탓에 현재는 잠시 중단된 상태다. 울산의 ‘왔어울산’의 경우 여행 성향 테스트, 고래패스, 스마트오더 등 실험적 기능을 탑재했지만, 관광상품 개발로 연결되는 구조는 미비하다.
이처럼 스마트관광도시는 어플·플랫폼 구축 후 운영 성과나 산업 파급효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스마트관광도시가 지속 가능하려면 지자체가 자생적으로 데이터를 설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지역 맞춤형 진단과 플랫폼 운영 개선 컨설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데이터가 쌓이기만 하고 실제 정책 설계나 관광객 유치 전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스마트관광도시는 결국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며 “관광을 단순히 숫자나 기술로 접근할 게 아니라 관광객이 원하는 콘텐츠와 경험으로 풀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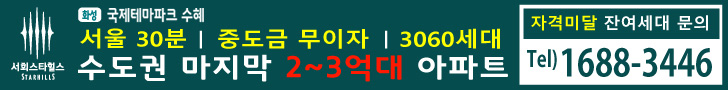





![[가계대출 불안감 계속] 3월 은행권 가계빚 1.8조 증가…토허제 영향, 이제 시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061903782654_258_161.png)
![[수출 불 꺼뜨리는 노조] 주문 넘치는데 활력 잃은 GGM 공장...노조 몽니에 상생모델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061933138184_258_161.jpg)


![[포토] 안국역, 헌재 앞 출구 폐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1/20250401165819828450_388_136.jpg)
![[포토] 장제원 전 의원, 오피스텔서 숨진 채 발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1/20250401091812249388_388_136.jpg)
![[포토] 눈물 닦는 김수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31/20250331171329906353_388_136.jpg)
![[포토] 경북산불 최초 발화지 합동감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31/20250331115135593464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