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철 전남대학교 연구석좌교수]
전통사회에서 경로사상의 핵심은 장유유서와 효공(孝恭)이다. 이에 따라 노인은 젊은이보다 우선적으로 대접받고 편안하게 살도록 받들어주어야 한다는 개념이 사회를 주도하여 왔다. 젊은 시절 가족과 사회에 봉사해 왔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마땅한 대접을 하여야 한다는 논지였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의 숫자적 증가와 돌봄과 부양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면서 경로중심의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전남대학교 백세인연구단에서 발표한 ‘한국의 백세인 이십년의 변화’(군자출판소 2021)를 보면 백세인을 가족이 직접 모시는 비율이 90%에서 50%로 격감하였으며 부모자식의 교류빈도마저 크게 감소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실이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전통사회에서 노인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이었던 가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전통사회에서 노인 봉양 서비스프로그램과 더불어 노인들에게 사회적 참여와 봉사를 적극 유도하였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인류에게 장수(長壽)는 오복 중에 첫째였다. 따라서 장수 즉 오래 삶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전통적으로 인간 오래 삶의 기본 단위는 한 갑자(甲子) 육십 년이었다. 따라서 개인이 나이 육십에 이르면 회갑(回甲)이라고 하여 온 가족들이 모여 오래 삶을 축하하였다. 이 보다 더한 축하로는 남녀가 부부가 되어 가족을 이루며 육십년을 함께 살면 마을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주는 회혼(回婚)이 있었다. 그런데 이 회혼제도는 서양에서 축하하는 결혼 육십년의 금강혼(Diamond Wedding)과는 근본적인 취지가 달랐다. 부부가 단순히 육십년을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부부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식들 그리고 그 다음 대의 손자들까지 먼저 세상을 떠난 자손이 없어야 만하였고 또한 죄를 지어 호적에 붉은 줄이 그어진 자식이 없어야만 회혼예를 치룰 수 있었다.
육십년의 의미를 부각하는 행사이외에도 조선조 초기에는 왕이 정이품이상의 당상관으로 칠십이 넘은 공신들을 기로소(耆老所)에 등재하여 해마다 철따라 음식을 하사하고 기로연을 베풀어 위로하고 축하하였다. 이후 일부 제도적 변화가 있기도 하였지만 기로소당상관의 위상은 존경의 대상으로 공식적인 예우를 받았다. 이와 같이 전통사회에서는 가족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노인에 대한 공경을 추진하였다. 이런 연로한 공신들에게 왕은 특별한 선물을 하사하였다. 바로 접이식의자와 지팡이인 궤장(几杖)이다. 이러한 전통은 이미 신라시대부터 시행되어왔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의 명장 김유신이 나이 칠십에 치사할 때 왕이 궤장을 하사하였으며 고려시대 김부식을 비롯하여 여러 공신들이 궤장을 받았으며
조선왕조에서는 기로소라는 공식적 기구를 설립하여 제도적으로 궤장을 하사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궤장을 받은 대표적 인물로 정인지, 이원익 등이 있다. 궤장을 왕이 하사한 이유는 아무리 나이가 들었더라도 지속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해주라는 간곡한 소망 때문이었다.
궤장의 궤는 검은 가죽을 덮은 오피궤(烏皮几)로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접이식의자로 다리가 아파서 앉고 서기가 불편한 노인들에게 모든 모임에서 행동상의 편리를 도모해주는 특별한 배려이다. 궤장의 장은 구각장(鳩刻杖)으로도 불리는 주칠을 한 지팡이로 머리에는 비둘기가 새겨져 있다. 비둘기와 같은 조류는 꼭꼭 찍어먹기 때문에 음식을 먹다가 체하거나 사레
들리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항상 건강을 조심하라는 속깊은 배려를 담았다. 그런데 유의할 부분은 지팡이의 밑부분이다. 지팡이 끝이 단순하게 뭉툭하지 않고 작은 삽이 달려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굳이 노인에게 하사한 지팡이의 끝에 보삽을 달았을까? 그러나 보삽의 역할을 생각하면 그 안에 숨은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다. 보삽이란 논두렁에 물이 막혔을 때 뚫어주거나 담벼락에 구멍이 나면 이를 보수하는데 사용하는 역할을 한다. 소소한 것을 처리해서 세상을 원활하게 돌아가고 유지하게 해주는 일들이다.
이러한 기능으로 유추해보면 나이든 사람들이 그냥 쉬거나 놀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윤활유적인 역할하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옛날 칠십이 넘은 연로한 공직자들에게 궤장을 하사한 뜻이 우선 궤(几)를 통해서 나이든 사람의 일상생활과 행동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함에 있고 나아가서 장(杖)을 통해서는 건강에 주의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는 연로한 공신이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치사(致仕)하여 완전히 은퇴하기를 바라지 않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지팡이 끝에 달린 보삽을 통해 아무리 나이가 들었더라도 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책임을 지고 봉사하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았다. 연로한 노인들에게 생활의 편리를 보장하면서 사회적 봉사를 계속하라는 염원이 깃들어 있었다.
바로 이러한 태도와 자세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면서 나이든 사람들을 단순한 돌봄 대상으로 피동적 복지차원에서 받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회적 자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을 이미 우리 전통사회가 제도화하고 활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 박상철 주요 이력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장 ▷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 회장 ▷전남대 연구석좌교수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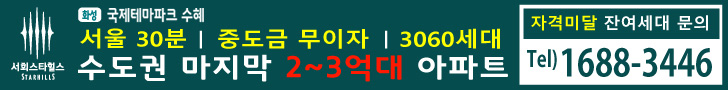

![[단독] 정부 1분기 한은 마통 32조 빼썼다…3월만 41조 역대급 영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1/20250401171448582500_258_161.jpg)






![[포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D-2,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112442620009_388_136.jpg)
![[포토] 제주 4.3 사건, 77년이 지나도 여전한 슬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112219393095_388_136.jpg)
![[포토] 안국역, 헌재 앞 출구 폐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1/20250401165819828450_388_136.jpg)
![[포토] 장제원 전 의원, 오피스텔서 숨진 채 발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1/20250401091812249388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