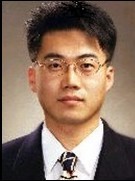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 우리나라는 사법권, 입법권, 행정을 일컬어 3대 권력기구, 3권이라 부르며 이를 각각 분리, 견제토록 함으로써 권력의 균형을 맞춰간다.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 우리나라는 사법권, 입법권, 행정을 일컬어 3대 권력기구, 3권이라 부르며 이를 각각 분리, 견제토록 함으로써 권력의 균형을 맞춰간다.여기에 언론, 언론기관을 제4의 권력이라고 부르며 경원시한다.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 부르는 건 막강한 권력기구인 3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자, 여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의 모습은 원 목적과 의무인 3권의 견제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것이 사실이다.
3권에 대해 분석하고 잘못을 시정토록 하기보다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소개하고 설명해주는 일이 주를 이룬다.
이 같은 변화는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 정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 주요 메체들의 운영권을 정부가 쥐고 있으며, 각 메체의 대표 역시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이뤄진 지 오래다.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정부의 언론에 대한 간섭과 압박에 모든 언론이 분연히 일어나 함께 대항하기보다는 뒤에서 박수치며 즐기거나 심지어 앞장서서 같이 비난한 결과이지 않나 싶다.
지난 2일과 3일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와 헌법의 탄생 배경, 역할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언론의 자유와 한계'라는 주제로 강의한 노희범 헌법연구관은 "삼성과 현대를 권력기관이라고 부르는 이는 없지만, 그들이 우리나라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 부르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수와 소수, 여와 야 간의 균형 유지를 통해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이런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기반에 사법과 언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면 힘없는 약자와 소수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며 "이런 경우 언론이 잘못된 심판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해줘야 하는데, 최근 모습에는 아쉬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일반대중'을 중요시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으로서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노력이 언론인은 물론 언론사에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