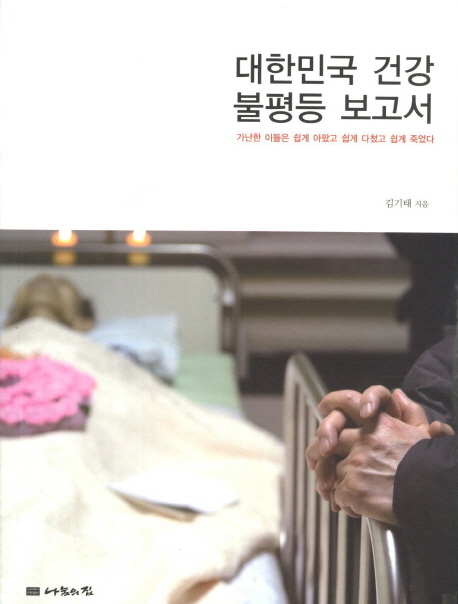
아주경제 박현주기자= "슬프게도, 현실에서는 사람의 목숨 값이 사회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쉽게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이유도 노동자의 목숨 값이 너무 싼 것이 이유였습니다."
‘대한민국 건강 불평등 보고서’를 펴낸 김기태씨는 "어릴 적 가난의 그림자는 노년기까지 길게 드리워졌고, 암도 가난을 차별했다"고 말했다.
주간지 기자인 그는 2010년 12월부터 석 달 동안 빈곤과 죽음에 관한 시리즈를 한 연재했다. 이 책은 그 시리즈를 묶은 것으로 우리 사회에 내재한 ‘건강 불평등’을 증언하는 또 하나의 기록이다.
아주대학교 중증외상특성화센터와 국립의료원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면서 곡절 많은 죽음의 사연들을 만났다.
가난한 이들은 보이지 않는 건강 불평등의 장벽에 매일 부닥치고 있었다. 질병들도 학력과 소득에 따라 ‘낮은 곳’으로 임했다. 각자의 사회ㆍ경제적 위치는 그 사람이 다쳐서 사망에 이르는 확률도 바꿔놓았다. 어른들의 건강에 금이 간 사회에서 아이들의 사망도 잦았다.
‘돈이 되는’ 암전문센터들이 전국의 대학병원에 줄줄이 생겨나는 동안, ‘돈 안 되는’ 중증외상전문센터는 한 곳도 제대로 문을 연 곳이 없었다. 그래서 ‘싼 목숨’들은 깊이 앓았고, 크게 다쳤고, 쉽게 사라졌다. 질병과 사고, 죽음을 개인의 드센 팔자 혹은 운명의 탓으로만 돌릴 문제가 아니었다. 계층과 죽음은 함수관계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의 목숨 값이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쉽게 오르내림을 확인하기란 어렵지 않았어요. 사람 목숨에 가격표를 다는 세상을 거부해야 할지, 잔인한 시장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가난한 자의 목숨 값을 그나마 높게 쳐달라고 요구해야 할지, 두 갈림길 사이에서 당혹스럽고 참담했습니다."
그는 "불평등하면 오래 못 살지만, 평등하면 오래 산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