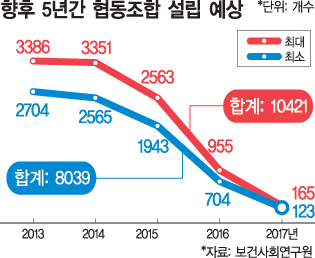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현재 전국에서 신청한 협동조합은 일반 160건, 사회적조합 21건 등이며, 이 가운데 일반 93건, 사회적조합 2건은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설립 신청한 조합 유형도 다양하다. 전통수공예·북카페 등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운영하는 지역밀착형 협동조합, 소상공인·농민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구매·공동브랜드·공동판매사업을 하려고 만든 사업자형 협동조합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정부가 협동조합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기존 주주나 사주가 결정권을 가진 기업과 달리 조합원이 주인이 돼 경제적 활동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더구나 저성장 기조로 장년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점이 협동조합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나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고, 자치단체의 고용·복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으로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상충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융·복합화된 정책환경에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협동조합이 주목받는 부분이다.
특히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성장뿐만 아니라 분배에 대한 부분도 조합원 분배 형식의 협동조합이 늘어나는 이유로 꼽힌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협동조합은 소액·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사회서비스 활성화로 복지분야에서 민간 역할을 확대하는 등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협동조합이 조합원간 불화나 이권이 개입될 경우 자칫 협동조합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초기 협동조합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해결하는 것도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나 설립 후 수익 분배, 지속 가능성 등을 꼼곰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주·자립·자치' 등 협동조합 기본원칙에 입각한 간접지원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과 유사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 등 각종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법인 위주의 현 법·제도에서는 협동조합의 동등한 시장 참여가 제한돼 정책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모든 부처에서 협동조합을 활용한 정책 개발과 관련 과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