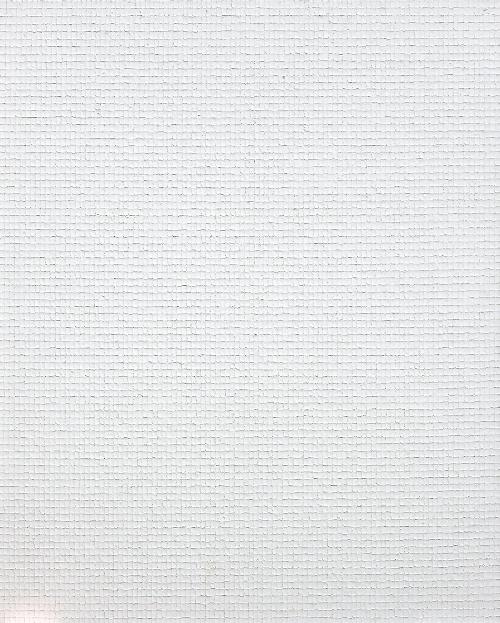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단색화. 일체의 구상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단색으로만 칠해진 회화다. 1970년대 시작된 한국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사조다. 최근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는 이우환의 작품이 널리 알려진 대표 단색화작품이다.
최근 이 단색화가 해외에서 조명받고 있다. 지난 6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아트 바젤을 비롯해 해외 유수의 아트 페어와 홍콩 경매 시장등에서 '한국의 단색화'가 인기다.
일명 '모노크롬'(단색화)으로 불리는 단색화 열풍의 중심에 원로 정상화(82)화백이 있다. 정 화백은 국내 미술시장 블루칩인 이우환 화백이 "가장 존경하는 작가"라고 꼽아 존재감이 더 빛난다
이런 분위기속에 갤러리현대가 4년만에 정 화백을 초대해 1일부터 개인전을 연다. 작가가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한 1970년대 작품부터 최신작까지 40여년간 올곧게 천착해온 그의 작업세계를 한눈에 볼수 있다.

[정상화 화백/사진=갤러리현대 제공]
전시를 앞두고 만난 정 화백은 그의 '흰 그림'같았다. 흰 베레모와 흰 셔츠를 입고 온 그는 흰머리에 흰 수염까지 온통 하얀분위기였다.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라고 운을 뗀 그는 "그림은 말이 많으면 못쓴다"고 했다. "자신있는 그림은 내용이 하나다"라는게 그의 철학이다.
작업방식은 '뜯어내기'와 '메우기'다.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대신 이 독자적인 작업 방식을 40여년간 고수해오고 있다.
작업은 반복과 시간과의 투쟁이다. 화면을 가득 메운 크고 작은 네모꼴의 모자이크는 캔버스 위에 5㎜ 두께로 고령토를 칠하고 마르면 캔버스를 규칙적인 간격으로 가로 세로를 접어 물감을 덜어내고 다시 물감을 채우는 과정을 하고 또 하고 또한다. 작업 자체가 수행이다. 흰색과 검은색, 자주색, 청색의 작품에는 그의 고뇌와 시간이 응축되어 있다.
"단색 속에도 보이지 않는 여러가지 색을 사용합니다. 다 같은 흰색이 아니라 흰색 속에 여러 색을 혼합해가며 사용하는 것이죠. 보이는 걸 그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그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그린 그림. 그래서 40년전에도 지금도 감상자들의 궁금증은 같다. "그림은 어디있나?"다.
1979년 파리에 있던 그가 서울에서 전시를 하기위해 그림을 들고 왔을때다. '그림 뭉치'를 풀어보던 세관이 "그림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이후 2005년 세월이 흘렀지만 변함이 없는 작품. 전시를 보러 온 관람객이 "근데 그림은 어디 있느냐"고 되물은 적도 있다.
처음부터 이런 그림을 그리진 않았다. "학교에 다닐 때는 철저한 구상 작품을 했다"던 그는 대학 졸업 후 "발로 밀고 손으로 쥐고 구기는 등 실패를 통해 얻어진 물체의 결과가 추상의 시작"이라고 했다. 시대의 변화에 의한 저항이기도 했다.
추상화에 매료당한건 당시 미국 대사관 앞에서 팔던 미군 잡지를 보면서다. "당시 한국에는 없었는데 통조림과 차 광고등 현란하고 고운 색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새로운 걸 요구하는 듯 했어요. 그게 추상회화를 시작하는 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정상화, 무제 73-12-11, 1973, 캔버스에 아크릴, 227.3x181.8cm]
초반에 많은 색을 썼던 작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색채를 추구하게 됐다. '그림같지 않은 그림'을 그리자 생활고가 늘 따라다녔다. 트럭에 배추를 옮기는 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적도 있고, 삽화도 그려 하루하루를 산적도 있다. 다행히 서울예고에 근무하게되면서 월급을 받았지만 또 꿈이 꿈틀거렸다. 파리에 가고 싶었다. "미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원화'를 보고싶다는건 큰 꿈이었다. 재산이 없어 외국에 가서도 빈곤은 계속됐다. 파리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다시 파리로 왔다갔다하며 작업에만 몰두했다.
그림을 조금씩 팔기 시작한 것은 그의 나이 56세때였다. 당시만 해도 그림이 돈으로 바뀐다는 것이 이상했다. "그 이후에 재료를 최고급으로 쓰고 있지요."
생활은 나아졌지만 그림은 바뀌지 않았다. 뒤집어 엎어버리는건 좋으나 애매하게 바꾸는건 용서못하는 그의 성격탓이다.
팔순이 넘자 체력에 한계가 왔다. 젊었을때는 미군에서 사온 천막을 대형 캔버스로 만들고 직접 옮기고 했지만 이젠 힘이 딸린다. 무거운 것을 혼자 들고 일해 탈장돼 대장암 수술을 2번이나 했다. 그럼에도 정 화백은 조수 한명 두지 않는다. "성격이 고약하다"는 그는 물감 붓등을 누군가가 손을 대거나 치우면 안된다고 했다. 욕심이 많은 듯도 했다. 정화백은 "산속에 들어가 작업하는 생활때문인지 그림을 나 혼자만 독점하고 싶다"고 했다.
정화백의 작업은 결과물만을 목표로 하는 보통의 예술가들과 다르다. 결과물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서 의미를 찾는다. 자신의 작업을 '과정'으로 정의 내리는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되풀이 되는 나의 일상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다.
그는 "똑같은 것을 계속한다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죽을때까지 삶과 더불어 이 반복이 계속 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 작업을 하는데도 늘 긍정과 부정이 따라요. 이 나이에도 '이거다' 하는 게 없어요"
40여년간 시간을 화면속에 차곡차곡 쌓고 있는 작가는 "예술은 일 자체가 끝이 없고 끝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그의 그림을 비롯한 한국의 단색화가 세계무대에서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현대작가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며 "당분간 이런 경향이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단순화해야 본질을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그는 후배작가들에게 "실패를 두려워말라"고 조언했다. "젊은시절에는 실험성이 중요해요. 현대미술은 재료 연구를 많이하고 시련을 겪어내야 합니다. " 전시는 7월 30일까지. (02)2287-3500

[정상화 화백/사진=갤러리현대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