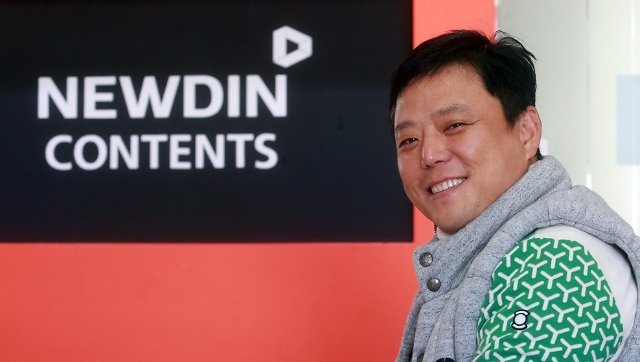
[김효겸 뉴딘 콘텐츠 대표. 사진=남궁진웅 기자]
마치 디즈니 만화처럼 불가능해보였던 일이 현실이 됐다. 스크린 골프, 스크린 야구는 친숙하지만 스크린 테니스는 아직 낯설다. 7년 째 아침마다 라켓을 쥘 정도로 테니스를 좋아하는 김효겸(47) 뉴딘 콘텐츠 대표는 ‘테니스 팟’이라는 스크린 테니스를 만들었다. 경제적 논리에 따라 점점 테니스 코트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 속에 자신이 좋아하는 테니스를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호주 오픈 4강 신화를 쓴 정현 같은 선수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스크린 야구 ‘스트라이크존’을 개발한 경험을 갖고 있는 뉴딘콘텐츠이지만 스크린 테니스를 만드는 것은 개발 본부장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정도로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센서가 테니스 공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고정된 상태에서 치는 골프, 일정 구역으로 공이 들어오는 야구와 다르게 테니스는 공간 전체를 센서가 인식해야 했다. 테니스공의 찌그러짐, 신발에 반사된 빛 같은 변수들을 일일이 계산해야 했다. 과거에도 테니스 스크린 업체는 몇 군데 있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대중화에는 실패했다. 뉴딘콘텐츠는 달랐다. 기술 개발을 위해 30여명의 직원들이 밤낮없이 노력했고, 상상은 점점 현실이 됐다. 김효겸 대표는 테니스 선수 출신인 곽용운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이 '테니스 팟'을 직접 쳐 본 후 "이전 기계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한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테니스팟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테니스를 즐기고 있다. 초보자들은 코치와 1대1 레슨을 통해 기본기를 배울 수 있다. 기존에 테니스를 쳐왔던 사람들은 설정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일주일에 세 번은 자신이 만든 테니스팟을 친다는 김효겸 대표는 “움직이면서 공을 칠려면 몸이 기억을 해야 한다. 요즘 백핸드 스트로크를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있는데 동호회 분들이 ‘백이 좋아졌어’라고 놀라더라”며 환하게 웃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 그다.
김효겸 대표는 유목민(노마드) 같은 삶을 살았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끊임없이 만들었다. 학창시절 전인권, 다섯 손가락 콘서트장에 갔던 김효겸 대표는 고등학교 때 대학로에서 락 밴드 스크드 로우(Skid Row)의 뮤직 비디오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영상에 매료 된 그는 대학 졸업 후 10년 간 방송 제작 PD로 활동했고, 이후 청와대 의전실 선임행정관, 서민정책비서관, 골프존 G&E 본부장을 거쳐, 뉴딘콘텐츠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여전히 새로운 꿈을 꾼다. 뉴딘콘텐츠 3층에 있는 회의실 이름은 ‘월트 디즈니’다. 김효겸 대표는 “제 영어 이름이 월트다. 영화 학도로 월트 디즈니를 좋아했다. 세계 최초로 영화에다가 음악과 소리를 집어넣었다. 어렸을 때 나의 우상이었다”며 “20세기 디즈니 랜드처럼 21세기 도시형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이 꿈이다. 공간을 기획하고 콘텐츠를 집어넣는 공간 사업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효겸 대표가 만들 21세기 도시형 테마파크가 기대된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