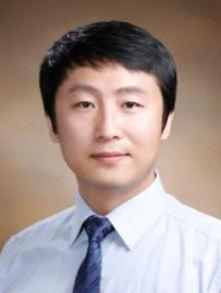
이경태 정치경제부 기자
대한민국호가 경제위기 속에 사면초가에 놓였다. 고용·내수·수출 등 3대 악재와 함께 갈등 요소까지 합세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달 고용상황을 보면 참담하다. 2월부터 5개월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청년일자리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8000억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고용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도 단언할 수 없다.
내수시장 역시 갈 길 바쁜 J노믹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다. 사상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 적용됐지만, 소비가 얼어붙고 있다는 지적만 나올 뿐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0을 기록, 전월보다 4.5포인트나 떨어졌다. 5월 이후 2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인 것이다.
지난해 3.1% 경제성장률을 견인한 수출 분야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순상품교역 조건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 100.64보다 7.3% 하락한 93.29를 나타냈다.
3대 악재는 곧바로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1분기 1.0%였던 경제성장률이 2분기 들어 0.7%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2분기 대비 0.1%포인트 오른 상황이지만, 지난해와 같은 3분기 수출 실적 잔치가 예상되지 않아 불안하기만 하다.
이런 악재 속에 한국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바로 갈등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했지만, 업계는 이에 불복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보이콧하겠다며 나섰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일궈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규제개혁에도 팔을 걷었지만,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은 첨예하기만 하다. 기획재정부의 신설조직인 혁신성장본부가 규제개혁에 대한 공론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공론화의 길은 멀기만 하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포용적 성장이다. 이는 미국의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들이 힐러리 클린턴 대선캠프를 통해 유행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포용적 성장’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아우르는 사람중심 성장이라고 설명한다.
경제정책의 기조를 쇄신했다고 해도 경제성장을 향한 정부의 어깨가 무겁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3% 경제성장 목표 달성조차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경제정책 기조가 무르익지도 않은 상황에서 상위 개념의 경제성장 구상을 논하다 보니, 정부 내부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다는 얘기까지 파다하다.
정부가 포용적 성장의 목표치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도 확신하긴 어렵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목표라든지, 소득 불균형 해소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결국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단기 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한 뒤, 실패하면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경제팀의 체질부터 바꾸는 데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 경제구상에 대해 새로운 개념이 더 이상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내실부터 갖춘 ‘한국형 경제성장 모델’을 마련하는 데 전념해야 할 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