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풍]
2016년 여름, 국립중앙박물관은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이란 제목의 특별전을 열었다.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전남 신안 앞바다 해저 10m 개펄에서 발굴한 유물 2만3천여점을 모두 공개하는 자리였다.
바다에 묻힌 이 배는 1323년 중국(당시 원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던 무역선으로 풍랑을 만나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 가운데 도자기 2만 여점은 중국 저장성의 용천요 생산품이 주를 이뤘고, 고려청자 7점도 있었는데 이것은 중국에 수출됐다가 일본인이 다시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신안해저선에서 건진 청백자 유리홍쌍엽문시명반. ]
해저선에 있던 유물 중에 시가 적힌 접시 하나가 있었다. 청백자 유리홍쌍엽문시명반이란 이름이 붙어 있는데, 중국 경덕진요에서 만들어진 접시다. 유리홍은 붉은 구리를 원료로 한 물감으로 무늬를 그린 뒤 백색 유약을 칠해 고온 환원 상태로 구워서 만든 자기다. 쌍엽문은 두 개의 잎사귀 그림이란 뜻인데, 좀 희미하긴 하지만 단풍이 든 나뭇잎 두 장이 마주 보는 얼굴처럼 쌍을 이루고 있다. 잎맥이 선연하다. 시명반은 시가 새겨진 쟁반이란 뜻이다. 시를 온전히 만나려면 그릇 하나가 더 있어야 하겠으나, 700년만에 바다에서 건진 것을 두고 하나가 없다고 불평하기는 좀 거시기 하다.
이 접시에 씌어진 시는 무엇일까. 당나라 말 희종 때의 궁녀 한씨(韓氏)가 쓴 시다. 나뭇잎 그림 위에 열 글자가 보인다. 流水何太急(유수하태급) 深宮盡日閒(심궁진일한). "흐르는 물이여 어찌 그리도 급히 가버리는가, 이 깊은 궁궐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는데." 한씨는 몹시 그 가을 궁궐 밖으로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이렇게 읊었다. 몹시도 심심했던 게 분명하다. 궁녀가 이렇게 할 일 없이 심심한 까닭은, 황제의 방문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단풍은 피같이 붉고 낙엽은 나비같이 나부끼는데, 남자라고는 파리 한 마리도 날아오지 않는 심심하고 심심한 구중궁궐에서, 문득 한탄하듯 이렇게 뱉었을 것이다. 유수하태급 심궁진일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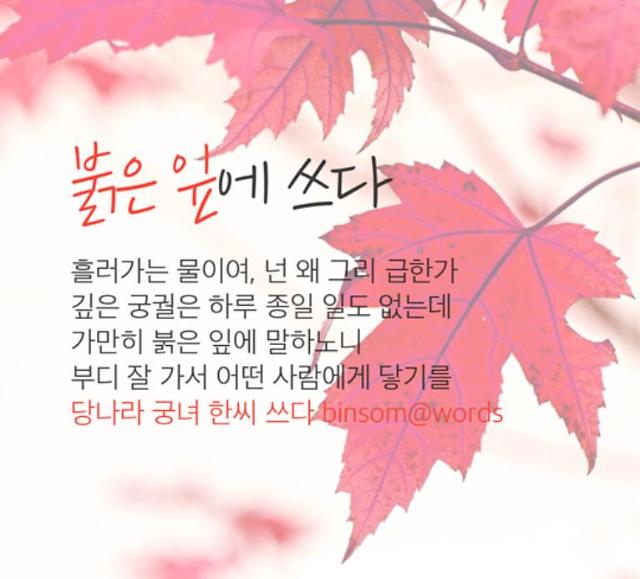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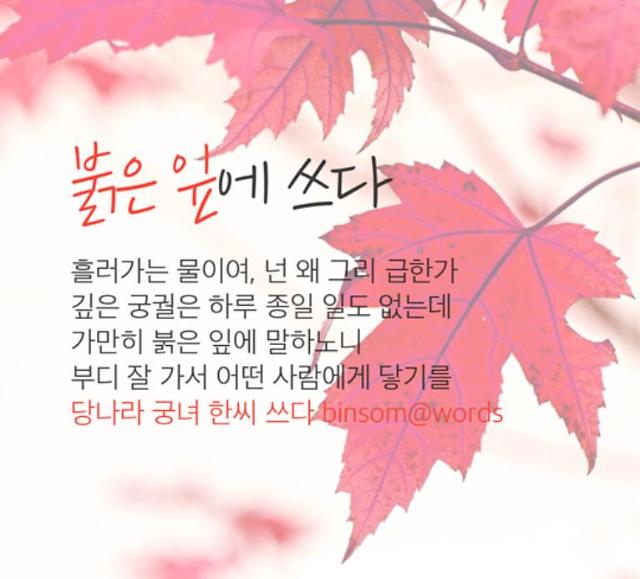
[붉은잎에 쓰다]
이 궁녀의 한숨이 운도 없게도 바다에 700년이나 묻혔다 다시 세상 사람의 눈 앞에 등장한 것도 기구하고 묘하다. 이 접시로서는 '단짝'이라고 해야할 나머지 접시를 잃어버렸으니 이 또한 억울한 이별이라 해야할 것이다. 대체 그 접시엔 뭐라고 씌어져 있었을까. 한씨의 절구 나머지 두 구절은 이렇다. 殷勤謝紅葉(은근사홍엽) 好去到人間(호거도인간). "남이 눈치 못채게 가만히 붉은 나뭇잎에게 말 하노니, 부디 잘 흘러가서 누구라도 좋으니 어떤 사람에게 닿으려무나"
한씨가 어떤 궁녀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황제의 총애가 식어버린 쓸쓸한 가을을 보내고 있었음에 틀림 없다. 궁궐 밖으로 흐르는 개울에 시를 쓴 나뭇잎을 띄워, 알 수도 없는 누군가와 마음을 교신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모 시인이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라고 읊은 것은, 저 당나라 궁녀의 시와 운명을 따라간 구절이라 할 만하다. 황실에서 저 시를 발견했다면, 아마도 일급괘씸죄로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었을, 발칙하고 앙큼한 이 시는 대체 그 개울물을 타고 어디로 흘러갔는가.
궁녀도 이 모호한 개연성에 운명을 맡겨보기로 했을 것이다. 이 환장할 심심함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미친 짓도 할 수 있다고 중얼거리면서, 나뭇잎 위를 긁어 자벌레처럼 시를 썼을 것이다. 저토록 무심히 급히도 흘러가는 개울물이 무슨 유정한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내 절망적 연애의 메신저라도 한번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턱없는 기대를 그 잎사귀 위에 하릴없이 적재해 보냈을 것이다.
이 여자에게 이성적인 판단이나 궁궐의 지엄한 법도를 요구하지는 말기 바란다. 그녀 나이 많아 봤자 스물 몇이며 경험이라 해봤자 이 크고 아름다운 뜨락 속에 들어앉아 한 남자를 기다리는 일 밖에 없었다. 이 무료하고 갑갑한 생에 이 정도의 이벤트도 못하게 말린다면, 그건 하늘도 너무한 것이다. 이 나뭇잎이 그냥 흘러가서 바다로 가버렸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씨의 이 시를 볼 수 없었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궁궐 밖의 누군가가 이상한 벌레 먹은 나뭇잎을 우연히 건졌고, 그 시는 세상에 소문이 났다.
궁궐에서 흘러온 나뭇잎에 씌어진 저 시는, 당대에도 세기의 로맨스처럼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시심을 흔들어댔을 것이다. 물론 누구의 시인지 알려지는 데에는 더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당대에는 다행히 나뭇잎 추파의 주인공이 그 행각을 들키지 않았기에 미스터리처럼 남았을 것이다.
이제 궁궐 밖에서 진행된 세렌디피티를 감상할 차례다.
나뭇잎은 그냥 개울을 따라 정처없이 흘러가버렸을 확률이 99.9%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우연히도 궁궐 밖 개울에서 한 남자가 떠내려오는 나뭇잎을 줍는다. 이런 인연설을 믿는가. 그 주인공은 우우(于祐)라는 사람이다. 이름도 '하늘이 돕는 사람'이란 의미니, 복이 많은 남자인 모양이다.
이 시를 읽고난 뒤 우우는 어떻게 했을까. 개울의 하류에서 상류에 있는 여인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전갈을 보낼 순 없지 않은가. 마음은 역류하지만 물은 역류하지 않으니 말이다. 고심 끝에 그는 과학을 동원한다. 궁궐로 흘러들어가는 냇물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침내 개울의 상류를 발견. 그는 그곳으로 뛰어올라가, 붉은 잎이 떠내려온 시각 쯤에 시를 쓴 나뭇잎을 흘려보낸다.
우우는 무슨 시를 썼을까. 아마도 5언 절구로 화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답가는 전하지 않는다. 다만, 봄날의 시에 댓구를 맞춘 듯한 시의 뒷부분이 전한다. 가을날이든 봄날이든 아마도 남자가 전하고 싶은 뜻은 같았을 것이다. 후아유(Who Are You)?
曾聞葉上題紅怨(증문엽상제홍원)
葉上題詩寄阿誰(엽상제시기아수)
또한 잎사귀 위에 쓰신 붉은 슬픔을 들었습니다
나뭇잎 위에 쓰신 시는 대체 누구에게 쓰신 것인지요
남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시가 적힌 나뭇잎을 본 순간 '운명의 황홀감'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저 높은 담 너머 궁궐 속에 나뭇잎시를 보는 여인이 있다. 그 여인은 고독하고 적막하게 이 계절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왕의 여인이니 이를 어찌 하리? 내가 넘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는가? 고독하게 살아가던 사내였다면, 절망감은 더했을 것이다. 운명이 이렇게 내게로 떠내려 왔는데,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벽이 저기 저렇게 도사리고 있구나. 하지만 개울물이야 막을 수 없지 않은가. 되든 안되든 소통이나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개울 언저리를 기어올라가, '그대'를 수배하는 시를 흘려 보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궁녀의 응답시가 전해졌더라면, 이건 그냥 시의 잔망스런 놀음이 되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허용된 '소통'의 운명은 일단 여기까지였다. 이후로 그들은, 붉은 나뭇잎 하나로 오간 정념의 자취들을 애써 지우고 살아야 했다. 이 이야기를 전한 '태평광기(太平廣記)'는 못말릴 운명의 후일담을 적어놓았다. 10년이 흐른 뒤 황제가 바뀌자 선황을 모셨던 궁녀 상당수를 방출했다. 중국황실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나 보다. 그때 한씨도 궁을 나왔다.
우우와 궁녀 한씨는, 한씨 친척의 소개로 만나게 된다. 재회는 아니지만 재회보다 더한 재회다. 첫날밤 우우는 붉은 잎 하나를 꺼낸다. 이런 시가 적혀있는 홍엽 하나.
殷勤謝紅葉(은근사홍엽) 好去到人間(호거도인간)
"남이 눈치 못채게 가만히 붉은 나뭇잎에게 말 하노니, 부디 잘 흘러가서 누구라도 좋으니 어떤 사람에게 닿으려무나"
한씨는 이 일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다시 펼쳐진 놀라운 인연에 눈이 동그래진다. 그녀는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지니고 있던 홍엽을 꺼내 보여준다.
잎사귀 위 붉은 슬픔을 들었습니다
나뭇잎 시는 뉘에게 쓰신 건지요
두 사람은 와락, 서로를 껴안았다. 부인이 된 한씨는 이렇게 읊는다.
흐르는 물 따라 흐른 한 구절의 시
십년 궁궐의 슬픔이 가슴에 가득하네
오늘 마침내 아름다운 짝이 되었으니
그래 알겠군요, 홍엽이 우리의 중매쟁이였음을
一聯佳句隨流水 (일련가구수유수)
十載幽愁滿素懷 (십재유수만소회)
今日已成鸞鳳侶 (금일이성난봉려)
方知紅葉是良媒 (방지홍엽시양매)
황제의 여인과 보통사내 사이에 스파크를 일으킨 그 사랑. 절대권력의 엄혹한 시절에도 이런 '장벽 없는 사랑'에 대한 열광은 대단했던 모양이다. 당나라 시인 이건훈은 '궁의 노래(宮詞)'라는 시에서 이렇게 읊는다.
궁궐 문은 늘 닫혀 있어, 댄스 드레스는 소용없네
황제는 뵌지 오래 됐고 귀밑엔 이미 흰머리가 나네
오히려 떨어지는 꽃이 부럽도다, 봄이 붙잡을 수 없으니
궁궐 개울을 흘러 저 바깥 세상으로 가는구나
宮門長閉舞衣閒 (궁문장폐무의한)
略識君王?已斑 (약식군왕빈이반)
却羨落花春不管 (각선낙화춘불관)
御溝流得到人間 (어구유득도인간)
고려의 대시인 이인로도 이 애절한 사랑의 옛이야기를 기억하며 어느 가을에 한 수 읊었다.
붉은 잎에 시를 써서 궁궐 밖으로 보낸다
눈물자국이 먹에 번져 아직도 뚜렷하네
궁의 개울 흐르는 물은 결코 못 믿겠지만
궁녀는 한 조각 마음을 흘려보내는구나
紅葉題詩出鳳城(홍엽제시출봉성)
淚痕和墨尙分明(루흔화묵상분명)
御溝流水渾無賴(어구류수혼무뢰)
漏洩宮娥一片情(누설궁아일편정)
고려 시인은, 한씨의 눈물 자국까지 그려내 실감을 돋웠다. 나뭇잎에 글씨를 써서 물위에 띄웠으니 그게 어찌 믿을 만 하겠는가. 거기다 눈물이 번졌으니 벌써 반은 젖었다. 그런데, 나뭇잎이 여울의 물살에 뒤집히기 전에 용케 우우가 발견했고, 글자 위에 떨어져 번진 눈물까지 읽어냈다. 이 가을, 오직 자기에게만 닥칠 사랑의 운명을 믿는가. 저 한씨와 우우의 홍엽처럼?
옛 쟁반그릇 하나에 담긴 시 한 편이 이토록 감수성을 돋운다. '영화'보다 실감나는 문자의 인문학이다.
이상국 논설실장
이상국 논설실장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