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아주경제 DB]
전기차를 포함한 배터리 시장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터라 소송전 결과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은 이전투구 끝에 극적 합의로 막을 내린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옛 SK이노베이션) 간의 분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동종 업계의 사례인 데다 인력 빼가기가 분쟁의 발단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직을 제한하는 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중론이지만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중국의 불투명한 근로계약 관행까지 더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는 모습이다.
◆중국판 'LG엔솔·SK온' 분쟁 터져
최근 CATL은 에스볼트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문제 삼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맡은 닝더시 인민법원은 다음달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2018~2019년 CATL 직원 9명이 에스볼트 관계사 2곳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기술 유출이 있었다는 게 고소의 이유다.
CATL은 닝더시 자오청구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해당 직원에 대한 중재 신청을 했고 중재위는 9명 전원에게 100만 위안 배상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닝더시 인민법원의 1·2심을 거쳐 확정됐다.
중재위와 법원은 직원들이 이직한 바오딩이신과 우시톈훙 등 2곳의 업체가 에스볼트 관계사라고 인정했다.
또 일정 기간 경쟁사로 옮기지 않겠다는 이직 제한 규정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점도 배상의 근거로 삼았다.
CATL이 에스볼트를 제소한 건 직원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를 근거로 한 후속 조치인 셈이다.
2019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이어진 LG에너지솔루션·SK온 분쟁과 닮은 점이 많다.
두 회사의 다툼도 LG 직원이 SK 경력직 공채에 대거 응시하면서 시작됐다.
LG 측은 "전 직원에 의한 기술 탈취"라고 주장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SK가 2조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경쟁이 격화하는 업종의 경우 지적재산권 보호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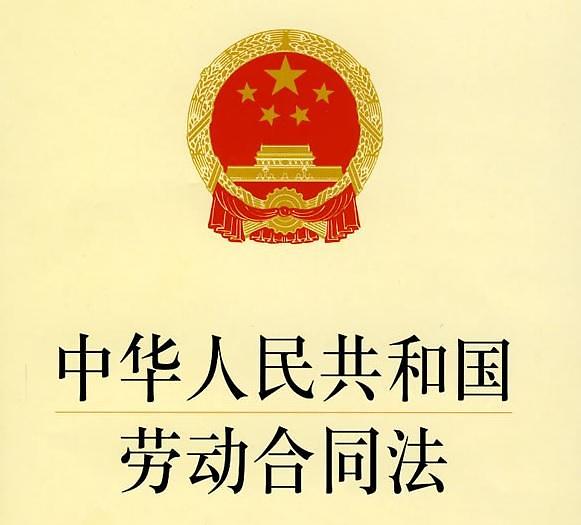
[사진=바이두]
이에 반해 CATL의 처사가 과했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도 한국처럼 근로계약서에 동종 업계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다.
배상 명령을 받은 9명 역시 해당 규정의 존재를 인지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문제는 이직을 통해 CATL의 핵심 기술을 유출했는지 여부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바오딩이신으로 이직한 5명 중 엔지니어는 3명인데 수석엔지니어 왕(王)모씨(1만7000위안)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월급은 1만 위안 이하다.
중국 근로계약법에 따르면 이직 제한 기간 중 기업은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조를 해야 한다. 왕씨는 경쟁사로의 이직이 금지되는 2년간 월 5200위안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지만 다른 2명은 2000위안 안팎에 불과하다.
대졸 초임이 5000위안 정도인 걸 감안하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수준이다.
기술 개발과 무관하게 제조 과정 조정 업무를 하던 엔지니어 천(陳)씨는 월급의 100배, 월 보상금의 400배를 배상금으로 물게 됐다.
엔지니어가 아닌 영업 전문가 장(張)씨는 CATL에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이직을 선택했지만 역시 100만 위안의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았다.
바오딩이신 외에 또 다른 부품 기업 우시톈훙으로 옮긴 4명은 이직 제한 기간이 3~6개월에 불과하다. CATL 입장에서 핵심 인력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방증이지만, 배상금 규모는 100만 위안으로 동일하다.
경제 매체 제몐은 "CATL과 에스볼트의 소송전을 계기로 CATL의 이직 제한 규정 남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CATL 직원이었던 왕웨이(王偉)씨는 지난해 말 이직을 결심했지만 실행이 쉽지 않았다.
왕씨는 제일재경과의 인터뷰에서 "이직 제한 규정상 자동차 분야에서 일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CATL 협력사로 가든가 아예 다른 업종으로 가든가의 선택만 있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올해 초 CATL의 한 합작사로 이직을 했다"며 "물론 처우는 과거보다 훨씬 열악하다"고 덧붙였다.
CATL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배터리·전기차는 물론 자동차·자동차부품까지 이직 제한 업종으로 묶어 놨다.
경쟁사 범위도 CATL이 영위하는 사업 분야 전체를 망라한다. 심지어 근로계약 체결 뒤 CATL이 새 사업에 뛰어들면 그 업종도 이직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기업의 자의적인 규정 적용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베이징의 한 변호사는 "이직 제한의 범위와 배상금 책정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없다"며 "지역별 배상금 규모도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이직 제한 규정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는 기업이 CATL만 있는 건 아니다.
창청자동차는 자동차 산업사슬에 포함된 130개 업체로의 이직을 막고 있다. 배상금은 최대 80만 위안에 달한다.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는 지난해 11월 근로계약 규정 변경을 통해 정직원 외에 비정규직까지 이직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중요한 만큼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도 보장돼야 한다"며 "이직 제한만으로 기업의 이익을 지킬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직원에 대한 공정한 성과 보상과 더불어 근로계약법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